
▽정보는 필요 없다=버핏 회장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없다. 주가 정보 단말기도 마찬가지다. 사무실에서는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는다. 서류는 팩스로 오갈 뿐이다.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하고 독서하며 지낸다. 1965년 쓰러져가는 섬유공장 버크셔를 인수한 뒤 지금껏 변하지 않은 근무방식이다.
그러나 버핏 회장은 ‘먹잇감’이 나타나면 쏜살같이 달려든다. 올여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레저용 자동차 제조회사의 인수 제안서가 팩스로 들어오자 바로 다음날 응낙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부채가 거의 없다는 점이 결정 이유였다.
2004년 한국의 20여 개 기업에 1억 달러(약 1041억 원)를 투자했을 때도 씨티그룹이 제시한 참고 자료를 후다닥 훑어보았을 뿐이다. 그는 “10분 만에 (투자 또는 인수) 기업을 알아내지 못하면 10주가 지나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경영은 자율에 맡긴다=버핏 회장은 42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일이 간섭하는 법이 없다. 이들에게 특별보고서를 써내라고 요구하는 일도 없다. 이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단일한 기업전략이나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가 2003년 5월 인수한 음식도매업체 맥레인의 그래디 로시어 CEO는 “버핏 회장은 (내게)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 자회사는 3억6000만 달러(약 374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에 버핏 회장은 “이보게, 우린 모두 실수를 한다네”라고 한마디 한 것이 전부였다.
이 진 기자 leej@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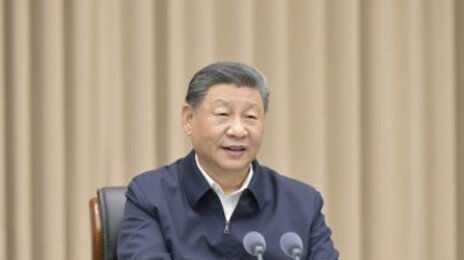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