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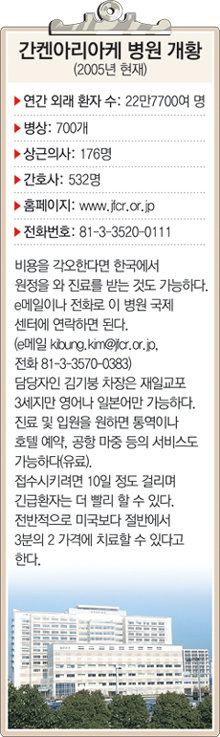

○‘생명의 수프’
이 병원에는 요즘 ‘생명의 수프’라 불리는 ‘병원식’이 준비되고 있다. 일본 프랑스요리계의 중진 이노우에 노보루(井上旭) 씨가 항암제의 부작용 등으로 식욕을 잃은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맛있게 영양을 섭취시키고 싶다며 제안한 병원식이다.
이노우에 씨는 올봄 어머니를 담관(쓸개관)암으로 잃었다.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는 의사에게서 한 달 시한부 선고와 함께 식사를 금지당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느 날 링거 대신 아들이 만든 수프를 먹고 싶다고 의사에게 호소했다.
보다 못한 이노우에 씨는 이 병원 소화기외과 히키 나오키(比企直樹) 박사에게 조언을 청했다. 히키 박사는 “고통스러운 치료는 그만두고 꼭 수프를 드시게 하라”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만든 수프를 몇 번이고 맛있게 마셨고 의사의 선고보다 긴 석 달 뒤 세상을 떠났다.
투병 중인 환자에게 맛있는 것을 먹게 해 주고 싶은 가족의 심정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히키 박사는 말했다. 링거를 통해서만 영양을 섭취하면 위장이 약해져 면역력이 저하되지만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상처도 빨리 낫고 면역기능도 활성화하는 것이 미국 의학계의 연구에서 밝혀졌다는 것.
히키 박사는 최근 이 같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병원 내에 부서 간 장벽을 뛰어넘은 영양지원팀(NST)을 만들었다. 마취과의, 한방의, 간호사, 약제사, 영양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환자의 영양관리를 담당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반 완화케어병동 로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구운 케이크와 차를 놓고 다과회가 열린다. ‘손님’은 암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
이곳에서는 모두 75명의 자원봉사자가 요일별로 환자 및 가족과의 상담과 다과회,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자원봉사자의 30%는 본인이 암 환자였던 사람들. 나머지도 환자 가족이 주축이 됐다. 병원은 전담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이들의 활동을 돕고 있다.
“병실은 고독하죠. 환자는 말을 그저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은 후지이 도모코(藤井智子·70) 씨의 말. 그의 자원봉사 경력은 벌써 20여 년에 이른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4년이 넘었다는 자원봉사자 덴노 히데코(天野日出子·55) 씨는 “암 환자가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사는 세상이 갈라지는 경험”이라고 설명해 준다. 그는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시스템-조직 환자 중심 운용
이 병원에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병원의 모토는 ‘환자 중심’. 모든 시스템과 조직은 환자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치료 과정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덜고 수술을 하더라도 장기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애쓴다.
가령 소화기외과는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복강경 시술에 적극적이다. 위암 2기 정도까지는 복강경으로 림프절 확청(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함)까지 완벽하게 끝낸다. 특히 유문(위와 십이지장의 경계 부분)을 보존하는 위절제술은 지난해 일본에서 가장 많은 450건을 기록했다. 유문을 남겨 두면 위장의 3분의 2를 잘라내도 정상 때 80∼90% 분량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히키 박사의 말이다. 지난해 전국 수술건수 1위(302건)를 기록한 자궁암 수술도 자궁 기능을 보존하는 노력으로 여성들에게 정평이 높다.
환자 중심의 진단과 치료 방침은 매주 목요일 오후 강당에서 열리는 의사들의 회의 ‘캔서 보드(cancer board)’에서도 확인된다. 까다로운 사례일수록 내과의와 외과의, 방사선과의가 의견을 종합해 치료 방침을 정하므로 의사 한 사람의 독단으로 진단이 잘못되는 일이 없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2차 의견’(다른 의사의 진단이나 조언)을 원하는 환자에게는 각 과 의사들이 논의를 거쳐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 전체의 견해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열린 협진 시스템은 의사들이 모여 있는 의국(醫局)의 구조에서부터 읽을 수 있다. 의사마다 칸칸이 막힌 개인 연구실을 가진 여느 병원과 달리 100여 명의 의사가 교무실처럼 된 공간에서 책상을 맞붙인 채 일한다. 원내 전자 차트를 통해 수시로 다른 과 의사들과의 상담이 이뤄진다. 히키 박사는 이를 ‘24시간 협진 체제’라고 말한다.
■ 완화케어과 무카이야마 박사
“환자 통증 줄여주면 치료 효과 좋아지죠”
“의사들은 암과 싸우다 보면 정작 환자의 고통에는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지난해 이 병원에 신설된 ‘완화케어과’의 무카이야마 다케토(向山雄人·사진) 박사는 암 치료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불필요한 통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치료효과를 낳는다고 역설한다. 완화케어과는 말 그대로 암에서 비롯된 갖가지 고통을 완화해 주는 곳.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들어가는 ‘호스피스’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주 다르다. 입원이든 외래든 협진시스템 아래 해당 과에서의 치료와 통증완화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대장암이 뼈에까지 전이될 정도가 되면 환자는 극심한 통증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완화케어 치료를 받으면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지요.”
그 자신이 23년간 약물로 항암치료를 해 온 전문가. 그러나 수술도 항암제도 듣지 않아 의사에게 ‘포기’ 선고를 받고 방황하는 환자들을 보며 끝까지 환자와 함께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환자들이 ‘거짓말같이 아프지 않다’며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항암제를 잘 써서 암세포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때와 같은 보람을 느낍니다.”
실제로 완화케어 병동에서 만난 한 어머니(66)는 말기 암 환자인 아들(32)이 이곳에 입원한 뒤 표정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1년간 시달리던 엄청난 통증에서 벗어난 아들은 식욕이 되살아나더니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는 암 환자에게 일찌감치 완화케어를 함께 받으라고 권한다. 통증으로 기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여야 약물치료나 수술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日 교과서 왜곡 :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 :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절차 >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데스크가 만난 사람
구독
-

영감 한 스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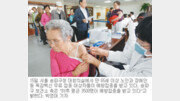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