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런던의 ‘리틀 평양’…탈북자들은 왜 영국에 몰리나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5일 14시 37분
글자크기 설정
NHK “런던 한인타운에 탈북자 마을…500여명 거주”
“美에 비해 안전·자녀 영어교육 유리해 선호”

영국 런던 교외에 ‘리틀 평양’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1970년대부터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지역에 2000년대부터 탈북자 500여명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작은 평양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25일 일본 NHK는 ‘리틀 평양 인 런던’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유럽 최대 탈북자 사회가 형성돼 있는 런던 탈북자들의 생활상을 소개했다.
런던 중심부에서 지하철로 약 20분 걸려 도착하는 뉴몰든역은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다. 낯익은 2층 버스는 런던 여느 지역 풍경과 다르지 않지만,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이 눈에 띈다.
이에 NHK는 영국 탈북자들의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일씨를 만났다. 북한에서 압록강을 헤엄쳐 중국으로 탈출했다는 김씨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끝에 영국에 도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다른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탈북자보다 좋은 환경에 있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실제 영국은 지난 2000년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북한과의 관계를 구축했다. 현재 영국은 평양에, 북한은 런던에 각각 대사관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차별이 있지만 영국에서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한국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을 하기에도 좋은 환경도 장점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생활이 마냥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다. 영어가 자유롭지 않다보니 탈북자들은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병원과 은행 등 일상 생활 모든 면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런던 거주 탈북자들에게 영어 교육을 지원하는 ‘커넥트: 노스 코리아’(Connect : North Korea) 회원인 한 여성은 “처음엔 나도 영어를 몰라 교육 부문에서나 병원, 전기 등 일상 생활에서까지 정말 고생했다”고 회고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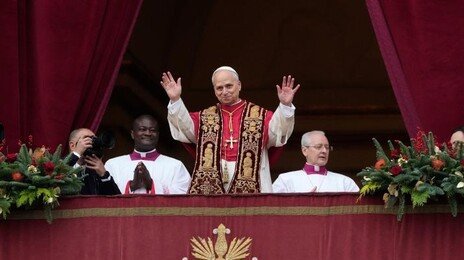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