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사람만…” 美 백신여권 확산에 ‘자유 침해’ 논란 격화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글로벌 현장을 가다]


종업원 해나 씨는 “처음에는 손님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손님은 당황한 기색이었고 또 다른 손님은 다소 반발했다”고 알려줬다. 일부 고객의 항의에도 대다수가 음식점 안에서 안전하게 식사를 하려면 접종 증명서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인근의 유명 식당 ‘카츠 델리카트슨’ 역시 줄 서서 입장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접종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고객들 또한 직원의 백신 증명 요구에 별다른 불만 없이 응하는 모습이었다.
곳곳에서 ‘백신여권’ 확대
뉴욕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극장, 술집, 공연장,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할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약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때부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을 실내로 들였다가 적발되면 업주가 벌금을 낸다.
아직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이라 현재 일부 시설만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곳곳에서 접종 여부 확인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수 있는 모바일 백신 증명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하는 종이 증명서가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외출할 때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신분증이 된 것이다.
미 전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지난달 20일부터 식당과 헬스장, 술집, 여가 시설 등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 역시 이달 13일부터 실내 시설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시카고에서는 백신 대신 실내 시설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가령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백신을 맞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도 지난달부터 술집과 식당, 헬스장 등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 또는 음성 확인 증명서를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는 아직 백신 의무화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식당과 공연장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의무화 반발 시위·소송 난무

식당 업주들 또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백신 의무화 대상에 종업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육체노동에 시달리느니 두둑한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종업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일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늘어나 일손 부족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필리페 마수드 씨는 CNBC방송에 “접종을 원치 않는 직원 두어 명이 그만뒀다.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회복 조짐 등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직장을 그만둬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게 어렵지 않아 회사나 업주가 백신을 강요하면 이직을 선택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공동으로 백신 미접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42%의 응답자는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 35%는 “의료·종교적 이유로 예외 인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백신을 맞겠다”는 답은 16%에 불과했다. 미접종자 10명 중 약 8명이 ‘직장 때문에 백신을 맞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지난달 초 미 CNBC방송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의무화에 찬성했고 46%는 반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집권 민주당 지지자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야당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정치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다.

다만 법원은 백신 의무화 쪽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6월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병원의 조치는 직원과 환자를 더 안전하게 하려는 선택”이라며 기각했다. 접종을 거부한 병원 직원들은 무더기로 해고를 당했다.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의 인디애나대 일부 학생들 또한 “학교 측의 교내 백신 의무화 방침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기각했다.
글로벌 현장을 가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발리볼 비키니
구독
-

기고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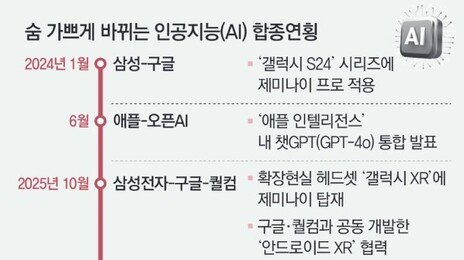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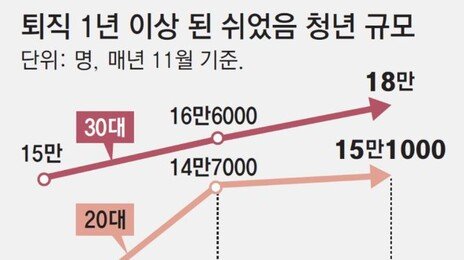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