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5·31교육개혁은 ‘결과적 평가’야 엇갈리지만
시대를 읽고 과감하게 선택한 전략·의지·리더십의 산물
이 정부 ‘4대 개혁’ 속 교육은 뭘,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유학기제는 그나마 괜찮은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도, 인물도 보이지 않아

일주일간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업적을 숱하게 읽고 들었다. 그런데 YS의 5·31교육개혁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다른 업적들과는 달리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인 듯하다.
“많은 이가 이른바 ‘문명사적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교육의 큰 물줄기를 바로잡은 역작이라고 상찬하는가 하면, 적지 않은 이가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으로 한국 교육의 본질을 그르친 실패작이라고 폄훼하기도 한다.”(안병영 하연섭, ‘5·31교육개혁 그리고 20년’, 2015년 5월)
안병영은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서 5·31교육개혁의 실행 사령탑이었다.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음에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5·31교육개혁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결과적 평가’야 진행형이지만 이 프로젝트는 시대 변화를 적극 수용해, 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재정적 뒷받침으로, 상당 부분 실천에 옮긴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는 YS를 비롯한 정책 리더들의 선견과 의지에 힘입은 바 크다. 당시 교육부 출입기자로서 교개위의 발족과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하루하루 취재 경쟁에 매몰돼 있던 필자는 훗날 5·31교육개혁에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형용사가 붙게 될지도 몰랐지만.
그 후 20년, 오늘을 본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표방했을 때 기자는 ‘창조 교육’도 기대했다. 개념이 애매한 ‘창조 경제’를 새로운 성장엔진을 통해 눈앞에 보여줄 수단은 ‘창의 인재’뿐이며, ‘창의 인재’는 지금의 교육 환경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으므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창조 교육 생태계’로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점도 교육 환경과 인재상이 크게 달라진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는 빗나갔다. 노동 공공 교육 금융의 4대 개혁 속에 교육이 들어가 있지만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기껏 부실 대학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대학 구조조정이 뉴스가 되고 있지만, 이 정부의 작품도 아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돌출해서 교육정책의 블랙홀이 된 것도 불행이다.
문제는 학교에만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중학교가 한 학기 동안 그 많은 학생들에게 토론과 실습,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려면 수많은 강사와 기업, 단체와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협조하는 곳은 드물다. 진로체험기관 선정은 학교가 56%, 학부모가 16%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교사의 업무는 늘어나고 학교는 고달프다.
대통령의 손발은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교육부와 유관 부처가 팔을 걷고 초빙강사단을 조직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며, 기업이나 단체, 공공기관 등에도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시범시행 3년 가까이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이 제도의 성패는 중학교가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다양한 강사와 기업,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시험을 안 보니 학원과 사교육이 늘어날지 모른다는 걱정은 본말전도다. 먼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일이지, 구더기를 무서워할 게 아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1학기에서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 빠르고, 3학년 정도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초등학교와 고교에도 진로탐색 기간을 두어 연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안→실행→평가→보완의 과정을 누군가가 의지를 갖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부의 교육행정에는 그럴 의지도, 그럴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그게 5·31교육개혁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심규선 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김순덕 칼럼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심규선 칼럼]박유하 교수와 야스쿠니 폭발, 그리고 언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12/14/75343781.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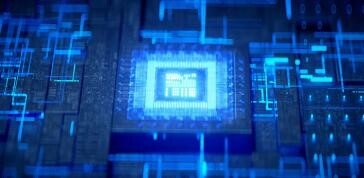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