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보도에 대한 보수의 불만 중에는 무리한 주장도 많아
하지만 우리 언론이 지켜온 공정 객관 형평성 유지,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확인 후 보도 원칙이 상당히 무너진 것도 사실
비상시국을 넘긴 이젠 보도 방식과 방향 놓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

독자와 기자 사이에도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독자는 기자에게 요구하고, 기자는 독자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독자는 기자를 겁박해서는 안 되고, 기자는 독자에게 비굴해선 안 된다. 미묘하지만 건전한 관계다. 둘 사이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나쁜 변수는 언제나 ‘권력’이었다. 권력은 늘 둘 사이를 왜곡하거나 이간질했다.
독자와 기자의 긴장 관계는 ‘독자가 읽고 싶은 기사’와 ‘기자가 쓰고 싶은 기사’의 일치와 괴리로 나타난다. 나는 1983년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지금부터 꼭 30년 전인 1987년 6·29선언 이전까지 3년 반가량은 권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독자가 읽고 싶은 기사도, 기자가 쓰고 싶은 기사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런 속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1986년에 폭로된 ‘보도지침’이다. 돌이켜보면 짧았던 그 시절이 기자로서 가장 자부심이 컸고, 독자로부터도 가장 존중을 받았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당시 독자와 기자는 ‘군부독재 종식을 통한 민주화’에 묵시적으로 합의했고, 기자는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걸 아는 독자는 기사의 행간을 읽어 주는 아량을 보여줬다.
6·29선언 이후 언론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독재에 침묵하던 신문의 갑작스러운 반정부 논조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 이후 독자가 읽고 싶은 기사도, 기자가 쓰고 싶은 기사도 넘쳐났다. 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대북 정책 기조와 언론 문제 등을 놓고 긴장이 재연됐다. 그러나 이는 독자와 기자의 직접적인 긴장 관계가 아니라 둘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될 권력이 저지른 패착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초부터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당시는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이전이다. 만나는 오피니언 리더들마다 ‘언론이 잘해야 한다’는 주문을 빼놓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똑같은 말을 이처럼 여러 번 듣기는 처음이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깊은 실망과 해법이 없는 답답함 때문인 듯했다. 나는 “잘나갈 때는 언론 칭찬하는 걸 못 들었는데, 안 되니 언론 탓이냐”라고 농반진반으로 눙쳤으나 그 이유를 고민했다. 결론은 ‘신뢰할 만한 그룹이 사라지면서 언론을 다시 보게 된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사건이 터졌다. 그때 보여준 언론의 긍정적 역할은 보고 들은 대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독자와 기자 사이에 불건전한 긴장 관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부정적인 얘기다. 언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도 많지만 요즘 ‘언론이 너무한다’는 말을 하는 이도 상당히 늘었다. 국정 농단 사건 보도가 양적으로 너무 많고, 지엽적이거나 흥미 위주의 접근이 많으며,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왜 그렇게 ‘알려졌다’는 기사가 많으며, 언론이 전지전능한 판관 역할까지 하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독자가 읽고 싶은 기사보다 기자가 쓰고 싶은 기사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나이가 지긋한 보수층이 많이 한다. 납득할 수 없거나, 근거가 희박한 주장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기자로 일해 온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일부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은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팩트(사실)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노력해 왔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너무 크고, 너무 이상한 사건을 만난 나머지 지금까지 지켜온 보도의 원칙을 어겨도 된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소수의 주장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면과 시간을 할애해온 것도 역시 언론이었다. 밖에서 오는 위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언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해 신뢰의 위기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런 질문이 들려온다. ‘당신은 보수 꼴통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지하느냐.’ 아니다. 다만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모든 기자가 일상적으로 해온 일이다.
심규선 고문 ksshim@donga.com
심규선 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김대균의 건축의 미래
구독
-

Tech&
구독
-

인터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심규선 칼럼]내 마음속의 전교조는 죽었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2/20/8296246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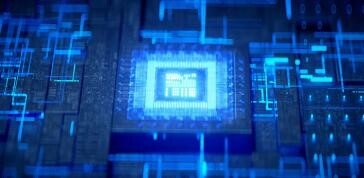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