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서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의 대통령 취임은 상황의 산물이고 시대의 요청이었다. 나 개인으로 보면 권력의지의 성취가 아닌 운명적 선택이었다.” 요약하자면 전 전 대통령에게 군사정변은 시대의 요청이자 운명적인 선택, 바꿔 말하면 ‘하늘의 뜻(天命)’이었다는 주장이다.
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 3월 YWCA에서 한 연설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 정권에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누가 한 4년쯤 실컷 고생하고 난 뒤 그때쯤 내가 맡는 게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시대가 그를 원했다면, 누구도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았다면, 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해야 했을까.
누구나 자기합리화를 한다.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명분을 만들어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합리화할 수 있느냐가 ‘정치력’을 재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명분과 행동의 간극이 너무 클 때다. 이 시점부터 자기합리화는 궤변이 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탈당 전후에 보인 행보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당을 결행하기 하루 전인 1일 밤 이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만났다.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홍 후보의 의지를 들어보겠다는 이유에서다. 만남 직후 이들은 입을 모아 “도와달라는 홍 후보의 얘기가 가슴에 와 닿았다”면서도 “(탈당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지켜본 한 정치권 인사는 “이들이 이미 탈당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홍 후보와의 만남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탈당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다. “도와 달라”는 홍 후보의 발언이 탈당파들과의 교감 속에서 나온 말이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돌고 있다. 홍 후보의 지지 요청에 고심 끝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싶었던 것일까.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들의 명분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여준 궤변과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이들이 내걸었던 보수 혁신의 기치마저 희화화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뜩이나 짧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진 막말 공방과 허망한 단일화 시도들은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 벌거벗은 ‘3류 정치’의 적나라한 이면은 ‘후진(後進) 정치’를 가속화할 뿐이다.
문병기 정치부 기자 weappon@donga.com
문병기의 뉴스룸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병을 이겨내는 사람들
구독
-

기고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문병기의 뉴스룸]J노믹스 성공하려면 ‘숫자 유혹’ 벗어나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5/26/84572305.1.jpg)
![‘제2계엄’ 막으려면 계엄법부터 바꾸라[광화문에서/황형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25004.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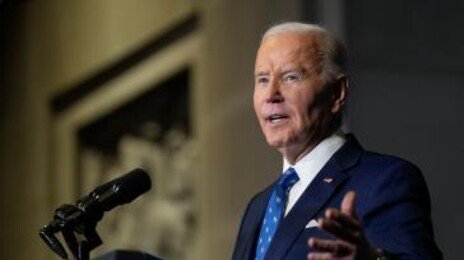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