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 패럴림픽선수단 최연소… 16세 태극소녀 윤지유양의 꿈

명랑한 아이였다. 또래들에 비해 움직임도 많았다. 그런 큰딸이 원인 모를 이유로 척수 주위 혈관이 터져 휠체어에 앉게 된 것은 세 살 때. 엄마 김혜숙 씨(49)는 “하늘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한동안 살기도 싫었다”고 말했다.
8일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탁구 대표팀의 윤지유(16·서울시청)는 한국 선수 81명 가운데 최연소다. 3년 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꿈나무 캠프를 통해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윤지유는 2015년 코스타리카오픈, 벨기에오픈에 이어 올해 슬로바키아오픈대회 등 3개 국제대회 단식에서 잇달아 정상에 오르는 ‘깜짝 활약’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윤지유가 탁구를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김 씨는 “지유가 탁구를 치고 싶다며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탁구장은 많아도 휠체어를 탄 아이가 탁구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숱하게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허락해 주는 탁구장을 찾았고 그곳 주인으로부터 “수원시장애인복지관에 가면 마음껏 휠체어탁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부터 윤지유는 엄마와 함께 집이 있는 경기 용인에서 수원을 오가며 탁구를 배웠다. 어린 여자아이가 탁구를 치는 것을 기특하게 여겼던 ‘프로급’ 아저씨들이 돌아가며 강사 역할을 해준 덕분에 윤지유는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칠 즈음 윤지유는 “탁구 선수가 돼 패럴림픽에 나가고 싶다”고 선언했다.
소속팀도 없고 국가대표도 아니었기에 각종 대회에는 자비로 나가야 했다. 김 씨는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회 참가 신청을 했고 딸과 함께 ‘외로운 투어’를 이어갔다. 이름 있는 코치를 찾아가 레슨도 받게 했다. 김 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윤지유의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입촌식이 열린 4일(현지 시간) 김 씨는 “지유한테 한 번도 메달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 지금도 한국에서처럼 일상에 대해서만 대화를 한다. 탁구를 시작한 뒤로 성격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긴 게 고마울 뿐이다.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해 서운함을 토로했던 작은딸도 이제는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며 웃었다.
최연소 대표가 돼 입촌식에 참가한 소감을 묻자 윤지유는 해맑게 웃으며 “글쎄요. 너무 더웠어요”라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했다. 하지만 엄마 얘기를 꺼내자 이내 표정이 달라졌다. “제 체급에 아주 센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달은 따도 우승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금메달을 딸 거예요.”
리우데자네이루=이승건 기자 wh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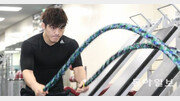


![[횡설수설/신광영]트럼프 최측근 “장관 하려면 돈 내세요”](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22639.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