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설수설/주성원]평창의 두 번째 드라마, 패럴림픽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클론’이 등장한 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은 사라졌다. 흥겨운 축제만 남았다. 2000년 교통사고로 휠체어에 앉았지만 ‘흥’만은 잃지 않은 강원래, 그와 변치 않는 우정을 과시하며 무대를 장악한 구준엽의 퍼포먼스는 그 자체로 평창 겨울패럴림픽 개막식 콘셉트 ‘공존’의 표현이었다.
▷패럴림픽(Paralympic)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존을 의미한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패럴림픽은 ‘나란히(para)’라는 뜻의 그리스어 전치사와 올림픽의 합성어”라고 설명한다. 올림픽과 나란히 열리는 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대회라는 의미다. 1988년 서울대회부터 지금처럼 올림픽 개최지에서 패럴림픽도 함께 열린다. 처음에는 ‘하반신마비(Paraplegic)’ 올림픽의 의미였지만 하반신마비뿐 아니라 절단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까지 참가하게 되면서 이제는 ‘나란히 가는(Parallel)’ 올림픽이 됐다.
▷시각장애인 스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과 동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다. 비장애 가이드러너가 앞서가면서 헤드셋을 통해 방향을 알려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선수는 그 신호에 따라 몸을 움직인다. 알파인이건 크로스컨트리건 가이드러너와의 호흡이 성적을 좌우한다. 선수가 입상하면 가이드러너가 함께 메달을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눈으로 보는 대신 청각에 의존해 사격하는 시각장애 바이애슬론에도 가이드러너가 있다. 여자 알파인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 양재림 선수는 스키 국가대표상비군 출신 고운소리 가이드러너와 4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다.
주성원 논설위원 swon@donga.com
횡설수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이승재의 무비홀릭
구독
-

국방 이야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가짜 금 주의보[횡설수설/이진영]](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2/133142685.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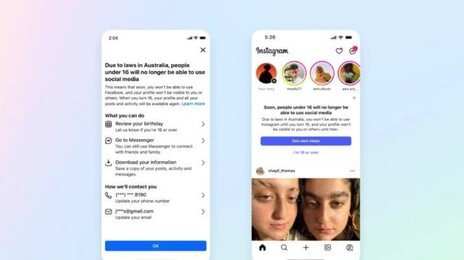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