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사람을 헤아릴줄 아는 작가, 따뜻한 글로 황량한 서점가 새바람

그녀와 나는 자주 ‘세트’로 묶였다. 이상하게 그랬다. 이천 년대가 시작되고 엇비슷한 시기에 등단을 해서인지 어쩐지, 하여간에 세트로 거론된 것이다. 간혹 함께할 자리가 있다 해도 그녀 옆에 앉기가 부담스러울 지경이었다. 뭐랄까, 사석에서도 굳이 김혜자 씨의 곁에 앉는 최불암 씨가 된 기분이 들어서였다. 더욱 난감한 것은 우리에게 따라붙는 젊은 작가들이란 수식어였다. 말이 좋아 ‘젊은’이지 뭔가 살짝 어리다는 뉘앙스의 애매하고 퀴퀴한 말이었다. 내 눈을 바라봐 난 이미 마흔이야, 항변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나는 늘 민망하고 억울했다. 열두 살 많은 아저씨와 세트가 된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런저런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보다 더 잘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늘 멋진 글을 써왔다. 브라보 김애란, 파이팅 김애란.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운 작가다. 아마도, 그녀의 글을 읽은 많은 이들이 이 말에 동의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글을 모르는 많은 이들도 동감을 표하게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녀의 힘은 무엇일까? ‘{’이라는 옛말이 있다. 풀어 말하자면 헤아린다의 명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애란을 떠올리면 언제나 일착으로 떠오르는 단어이다. 그녀는 헤아리는 사람이다. 헤아리는 존재이고, 헤아리는 작가이다. 어리다, 젊다, 재기발랄하다 유의 개똥 같은(지겹지도 않냐?) 말보다는 고백하건대 그녀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어쨌거나 그녀는 달려왔다. 달려갈 것이며, 이 무슨,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이라니…. 하여간에 또 세트로 묶여 ‘김혜자 씨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와 같은 청탁을 나는 받아야만 했다. 파,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최불암 씨처럼 웃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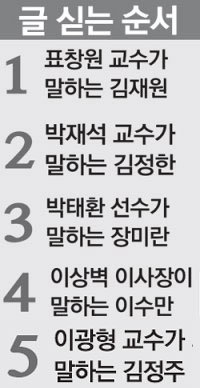
박민규 소설가
[2012 선정]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박민규 소설가가 말하는 김애란 작가](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