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을 처음 경험한 것은 일본에 와서 두 달 지난 무렵이었다.
일본인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듯해 ‘심상치 않다’ 싶어 얼른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다. 진동이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래에 숨은 건 나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는 진도 3 정도였다”며 식사를 계속했다. 머쓱한 표정으로 일어나자 “일본에 있으면 이 정도는 금세 적응할 것”이라며 웃었다. 이후 실제로 1년에 서너 번씩 비슷한 지진을 겪었지만 식탁 아래로까지 내려가진 않았다.
하지만 올해 4월 구마모토(熊本)의 호텔 방에서 경험한 ‘진도 6강’(한국 기준으로는 9·일본은 0∼7, 한국은 1∼12의 서로 다른 진도 기준을 사용)의 지진은 그야말로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한밤중에 몸이 위아래로 널뛰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침대를 간신히 잡고 있는 것뿐이었다. 어디로 숨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머릿속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전 세계 강진의 4, 5건 중 1건이 일본에서 일어난다. 일본 정부와 학계는 지진 예측을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했다. 하지만 결론은 지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과거 기록을 분석해 ‘수도권에서 규모 7.0 이상의 직하형 지진이 30년 내 일어날 확률이 70%’라는 정도로 예측하는 게 고작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 지진이 나더라도 무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뿐이라는 얘기다.
기자는 지난달 경주에서 지진이 난 후 일본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에도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기사를 썼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학계에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반론이 잇달았다. 국민들의 불안을 공연히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한반도에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진이 적은 편이다. 큰 지진일수록 드물기 때문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언젠가는 한반도에서도 강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괴담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드러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일일 것이다.
내진 설계를 보강하고 지진 교육 및 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은 가장 강한 진도 7(한국 기준으로는 10∼12)의 지진이 닥쳐도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집이 10채 중 8채나 된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처음 몇 분 동안은 집에 있는 게 안전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매뉴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나아가 학교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하는 점도 본받을 만하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젠가 ‘땅이 꺼지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이번처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그때 지진이 이번보다 강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장원재 도쿄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특파원 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이상곤의 실록한의학
구독
-

이승재의 무비홀릭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특파원 칼럼/동정민]유럽 극우열풍, 이것이 실체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10/10/8070321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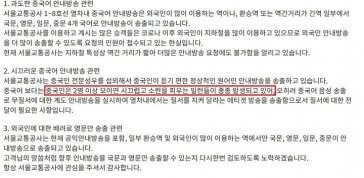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