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일러스트 고수를 찾아라’ ③ 민아원
“매트릭스의 ‘빨간 알약’ 같은 그림 그리고 싶어”
여성의 생식세포 ‘난자’. 난소에서 방출되는 단세포의 알이다. 민아원(32) 씨는 요즘 온통 난자 생각뿐이다. 임신을 위해서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을 위해서기도 하다.
민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뉴요커’였다. 미국 명문 미대인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SCAD)’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메리칸 일러스트레이션(American Illustration), 커뮤니케이션 아트(Communication Arts) 등 굵직한 공모전에 입상하면서 일러스트계의 유망주로 떠오른 것. 덕분에 O1비자(특수재능비자)도 받고 미국 뉴욕에서의 외로운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도 찾았다.
하지만 휴식을 위해 잠시 귀국한 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운명처럼 남편(한의사)을 만나면서 미국 생활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올해 결혼한 지 3년쯤 됐다는 민씨가 난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임신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그 전까지는 월례행사인 배란에 대해 크게 관심 가져 본 적이 없다. 임신준비를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난자가 인간이 가진 세포 중 가장 크고 완벽하며, 또 몸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세포라는 내용을 한 책에서 접한 후 더욱 흥미가 생겼다. 마침 스튜디오 ‘더블디’와 여성성을 동기로 공동작업을 하게 됐는데, 내 관심사인 난자를 작품 소제로 선택했다.”
“아이디어 궁하면 사람 많이 만나”
-어떤 작업인가?
“달력작업인데, 11월에 있을 ‘언리미티드 에디션(독립출판물 아트북페어)’ 참가를 목표로 5명의 작가가 여성의 신체, 자궁, 성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일러스트 작품을 제작 중이다.”
-다른 작가와는 다른, 본인 작품만의 특징은?
“사람마다 중점을 두는 점이 조금씩 다른데, 나는 유독 텍스트를 표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림으로서 한 장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텍스트와의 호응도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고를 받으면 텍스트를 분할해서 키워드를 뽑고,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이미지와 상황, 단어 등을 최대한 많이 찾아낸다. 그러고 나서, 약간의 생각을 요하는 의외의 조합으로 레고 조각처럼 조립을 한다.”
-작품 아이디어와 소재는 어떻게 찾나?
“책에서 많이 얻는 편이다. 지금 작업하는 난자달력은 ‘여자, 내밀한 몸의 정체’라는 책을 읽으면서 소재를 많이 얻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 특히 남편이 역사, 생물 분야 독서광이라 소재가 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아 ‘십분 활용’한다. 아이디어가 궁하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에게서 찾으라는 어머니의 조언도 늘 새긴다.”
피폐해진 뉴욕 생활…태블릿 붙잡고 울기도
어렸을 때부터 화가를 꿈꿨던 민씨는 단 한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처럼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대 산업디자인과에 들어갔다. ‘세계 3대 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 마크 뉴슨, 필립 스탁 등을 막연히 꿈꾸며. 하지만 아무나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은 아니었다. 스스로 한계에 봉착한 그는 전공과목을 배울 중요한 시점인 대학 3학년 때 교환학생 자격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 도시에 있는 대학이었는데, 그곳에서 일러스트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때 ‘이거구나’ 싶었다. 그림을 취미가 아니라 직업으로 해야겠다는 결심도 그때 섰다.”
-유학을 떠난 이유도 그래서인가?
“한국에서 일러스트 공부를 하려면 홍대 등지의 사설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 코스였다. 등록을 해서 한 달 정도 다녔는데, 한 달 내내 다른 작가 동화책 수채화 베끼는 작업만 했다. 정말 못 견디겠더라.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각종 시사주제를 담는 신문과 잡지의 에디토리얼(사설용) 일러스트였다. 미국 남부에 있는 SCAD 대학이 나에게 딱 맞는 학교였다. 동화일러스트 교육과정도 있고. 무엇보다 서배너라는 소도시가 참 좋았다.”
-힘들지는 않았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1년 뉴욕으로 이사를 해 일단 프리랜서 작가 타이틀을 스스로 붙였다. 미국 체류 신분유지와 생활을 위해 일러스트레이터 에이전시와 일러스트잡지사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공모전이란 공모전은 닥치는 대로 출품했다. 운 좋게도 굵직한 공모전에 당선된 덕분에 O1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림스타일에 변화를 꾀하면서 정신적으로 가장 피폐해졌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의 장점이자 단점이 내 손에서 A부터 Z까지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이다. 학교를 떠나 교수나 동료들의 비평 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온전히 내 결정만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 그림이 마음 같지 않은 날엔 태블릿(펜 그림판) 붙잡고 울기도 하고, 잘 되는 날이면 종일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고 새벽부엉이처럼 그림만 그렸다. 귀국 후에는 홀로 골몰하는 위험성(?)을 깨닫고 공동작업실을 꾸려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작업한다.”
“그림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
민씨와 함께 공동작업실을 꾸린 이들은 4명. 대학원 동문도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도 있다. 동화 일러스트레이터와 건축설계사, 디자이너 등 직업도 다양하다. 이들 모두 각자 일을 하면서 서로 조언 해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면서 시너지를 얻는다고 한다.
민씨는 2013년 ‘아는 동화 모르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딸에게 포스트잇’ ‘마음을 실험하다’ 등 3권의 책(슬로래빗)에 그림저자로 참여하고, 시공사에서 최근 발간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와 ‘소리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아이를 변화시키는 훈육법’이라는 두 권의 책 일러스트 작업도 했다. ‘아는 동화 모르는 이야기’에 그린 일러스트가 캐나다 공모전에 당선된 것을 계기로 미국 잡지사로부터 일러스트를 의뢰받아 그리고 있다.
그에게 일러스트는 무엇일까?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랄까. 당시의 관심사나 가치관, 태도가 의도치 않게 그 속에 항상 녹아나니까. 잔소리하는 절친 같은 느낌도 있다. 예전 작품을 보다 보면 종종 ‘너 왜 그랬니’라고 책망을 받거나, ‘참 잘했네’라면서 칭찬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궁극적으로 어떤 작품을 그리고 싶나?
“‘잘’ 그린 그림보다 ‘의미’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남편 표현을 빌리자면, 매트릭스의 ‘빨간 알약’ 같은 그림이랄까. 언젠가는 일러스트에 이야기를 가미한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만화 소설)’이라는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
-------------------------------------------
◆ 민아원 작가는?
출신 : 서울
학력 : 서울예고·이화여대 산업디자인과·美 SCAD 대학원 졸업
경력 : 3×3 Magazine(쇼 코디네이터)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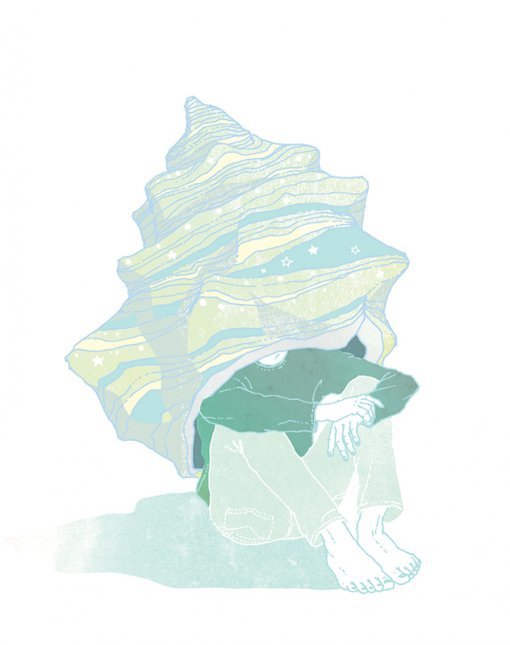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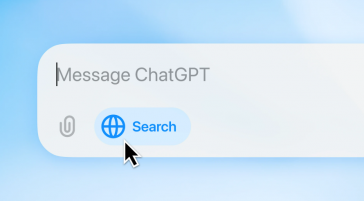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