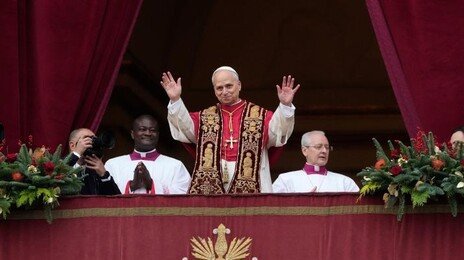공유하기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
-
입력 2000년 4월 11일 11시 10분
글자크기 설정
극장에 들어설 때 마침 변혁 감독의 '인터뷰'상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 왜 극장밖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듯, 나오는 사람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대체로는 무표정을 가장한 딱딱한 얼굴들이던데 한 무리가 나오면서 "되게 복잡하네" "네가 보자고 했잖아"하고 크게 떠들자 여기저기서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만족보다 불평의 목소리가 더 크기 마련이지만,'인터뷰'를 꽤 괜찮게 본 제겐 좀 의외의 반응이었지요.
그러고보니 '인터뷰'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도 극단적이네요. 동아일보 '주말개봉영화 시사실'에서 평점을 매기는 평론가 5명의 '인터뷰'에 대한 평가도 A0부터 C-까지 분포돼 있습니다.보통 B언저리,C언저리에 몰려있거나 아주 좋은 영화이면 A언저리에서 평점이 매겨지곤 하던 걸 생각하면 이 영화에 대한 평가의 엇갈림은 꽤 심한 편입니다.
영화평론가 조혜정씨는 '인터뷰'에 대해 "지적인,너무나 지적인….찬사와 저주를 함께 받을 영화"라고 촌평했는데 그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찬사'라면 이 영화가 진실과 영화 만들기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 지적인 영화이기 때문일 터이고, '저주'라면 외피로 선택한 멜로의 틀이 진부하기 짝이 없고, 감독이 영화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영화학도의 자의식 밖으로 걸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석(이정재)과 영희(심은하)를 중심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일반인들의 솔직한 고백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섞여 있는 '인터뷰'는 사실 주제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영화입니다.
사랑의 실체, 진실과 허구의 경계에 대한 탐색보다 이 영화에서 더 공들여 묘사된 듯한 대목은 영화를 다루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감독의 고민입니다. 영화 후반부에 다큐멘터리 속 인물들인 박용 박청화 커플의 진짜 결혼식이 치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에게 이정재가 다가가 "최은석 감독입니다"하고 말을 건네고 진짜 결혼식의 주인공들은 아,그러냐고 반갑게 인사를 받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정재가 영화배우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탓에 픽션의 정체보다 다큐의 진실성이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지만 다큐멘터리 속에 뛰어든 허구의 인물은 뭐가 진짜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 지점에서 머뭇거립니다. 기막히게 다큐와 픽션을 엮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 더 개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혹 허구가 다큐의 진실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다큐에서 의도적인 과장과 축소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면 소재를 다루는 사람들의 경우 허구의 드라마를 만들 때에도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감독의 진지한 고민이 이 머뭇거림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이 머뭇거림이 제게는 꽤나 매혹적이었지만, '인터뷰'의 가장 큰 맹점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인 것같습니다. 영리한 형식과 기술적인 세련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는 관객과 소통하는 지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감독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걸까"하는 대사와 영화의 처음 시작 5분간에 대한 토론의 반복, 언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할지 헷갈릴 정도로 애매한 엔딩 장면 등은 '영화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만을 목표로 삼은 과잉된 자의식의 소산인 것 같아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머리로 만든 영화처럼 보이는 '인터뷰'가 실험적인 작은 영화였더라면 생경함이 좀 덜 했을까요. 스타 배우인 심은하,이정재가 출연하고 막강한 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의 배급력에 실려 관객과 만나게 된 '인터뷰'는 실험적 시도와 상업적 구조가 아슬아슬하게 만난 지점에서 탄생한 불완전한 영화인 듯합니다.
김희경<동아일보 문화부 기자>susanna@donga.com
교원평가제 시행 논란 : 사설·칼럼 >
-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구독
-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교원평가제 수용하고 평가방법 따지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가습기 살균제 사태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 인정[횡설수설/김재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038745.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