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혜가 눈을 뜨자 어머니 완선이 인혜의 몸을 덮을 듯이 앉아 있었다.
“아가씨는?” 인혜는 차분한 자기 목소리에 놀랐다.
“아이고, 멍석에 둘둘 말려서…”
“어디로?”
“집안에도 못 들어가고, 잠시 마당에 내려놓았다가, 너거 시아버지하고 이 서방이 리어커에 실어서…”
“장례식은?”
“애장으로 치르겠제. 부모보다 앞서 죽었으니 불효자식이다 아이가”
“산소는?”
“시어머니가 하도 울고 제 정신이 아니라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어지만도, 교동 어디다 묻지 않겠나. 산소라고 해봐야 조그맣게 구멍 파고 돌 쌓는 거 뿐이니까…”
“아이고”
“너는 아 낳는 일에만 신경 써라. 어떻노, 진통은?”
“아픈 게 다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벌써 양수가 터졌으니까, 금방 나올 거다. 치마가 홈빡 젖어가지고, 면서기 최씨하고 쌀가게 김씨 아저씨가 들쳐 업고 왔다”
최씨와 김씨 아저씨가? 시신을 건져올린 손으로 나를? 아이고, 인혜는 온몸에 물과 썩은 살덩이 냄새가 들러붙어 있는 듯하여 진저리를 쳤다. 자신이 썩은 냄새와 함께 몸 바깥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자기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혼처럼.
“아이고, 아직 일곱 달 밖에 안 됐는데, 충격 받아서 양수까지 다 터지고…제대로 나오겠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을 닮아 큰 거니까. 배도 이렇게 부르다 아입니까.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나와 줄 겁니다. 아, 참, 다들 점심은 어쨌는고? 내가 밥을 짓다 말고…”
“다들,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다”
“도련님도예? 어른은 참을 수 있어도, 도련님이 가엾네예. 배도 곯고, 슬프고…돌아오면 뭐 좀 만들어 주이소”
“너도 지금 뭐 좀 먹어둬야 안 되겠나, 하루 온종일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몇 십니까?”
완선은 혼수품으로 들려보낸 벽시계를 보았다.
“열한시 반? 어매, 열한시 반일 리가 없는데”
글 유미리
8월의 저편 >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소설]8월의 저편 215…몽달귀신(17)](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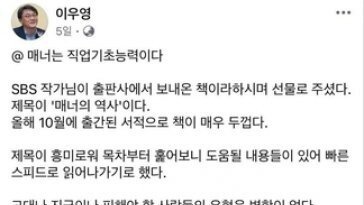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