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158>卷三. 覇王의 길
-
입력 2004년 5월 21일 17시 44분
글자크기 설정

“그렇다면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 패공과 생사를 함께하겠습니다.”
앞일을 헤아려 꾀를 펼치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장량이었으나 그때는 그로서도 어찌해볼 수가 없었다. 번쾌의 우직스러운 충성과 하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기로 하고 말없이 뒤따랐다.
번쾌는 갑주를 여미고 언제든 뺄 수 있게 장검을 비껴 차더니 방패를 집어 들었다. 그런 번쾌가 군문(軍門·진문)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항우를 지키는 위사(衛士)들이 길을 막으며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다. 번쾌가 방패를 들어 후려치니 위사들이 당해내지 못해 더러는 땅바닥에 엎어지고 더러는 멀찌감치 밀려났다.
그렇게 열린 길로 군문을 지난 번쾌는 곧장 항우가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뒤따라오던 위사들도 번쾌가 장막을 들추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더 따라붙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소란 때문에 장막 안의 사람들은 모두 번쾌에게로 눈길을 모았다. 그리 되니 항장과 항백의 칼춤도 절로 멈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패공 곁으로 간 번쾌는 서쪽을 향해 서서 눈을 부릅뜨고 항우를 노려보았다. 머리카락은 위로 곤두서고, 눈꼬리가 찢어질 듯 눈을 부릅뜬 그 모습이 여간 흉맹(凶猛)스럽지 않았다. 어지간한 항우도 그런 번쾌를 보고 일순 긴장했다. 검을 끌어당기며 무릎을 세워 언제든 맞받아칠 태세를 갖추고 물었다.
“너는 웬 놈이냐?”
그러자 번쾌를 뒤따라오던 장량이 얼른 번쾌를 대신해 대답했다.
“이 사람은 패공의 참승(參乘·수레 오른쪽에서 호위하는 장수)인데 번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로 알 수 없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당연히 번쾌의 난입(亂入)을 꾸짖을 줄 알았던 항우가 끌어당겼던 칼을 제자리에 세워두며 껄껄 웃었다.
“참으로 씩씩한 사내로구나. 저 사람에게 술 한 잔을 크게 내려라!”
그게 항우였다. 항우는 깨끗하게 머리 숙이고 드는 자에게 관대한 것만큼이나 두려움을 모르는 꿋꿋한 무골(武骨)을 존중할 줄도 알았다. 그날 패공 유방과 번쾌 두 주종(主從)은 우연히도 항우의 그와 같은 심성의 양면을 때맞추어 긁어댄 셈이었다.
항우의 명에 따라 한 되들이는 좋게 되는 큰 술잔에 독한 술이 그득 채워져 번쾌에게 내려졌다. 번쾌는 방패를 든 채 고마움을 나타내는 예를 올린 뒤, 선 채로 그 큰 술잔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그 호탕함이 마음에 들었는지 항우가 다시 시중드는 군사들을 보고 말했다.
“술잔이 그만 한데 안주가 없어서 되겠느냐? 저 사람에게 돼지다리 하나를 주어라.”
그 말에 군사들이 큰 돼지다리 하나를 번쾌에게 날라 왔다. 기록에는 ‘익히지 않은 큰 돼지 다리 하나[일생체견]’ 라고 되어 있으나, 돼지 다리는 익히지 않고 먹을 수 없으므로 ‘익히지 않은[生]’이란 글자는 잘못 들어간 것이라 한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동아시론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오! 여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三. 覇王의 길](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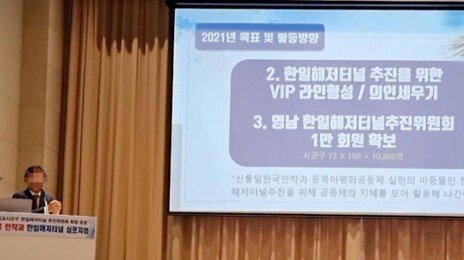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