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곡상을 원용한 한스 홀바인의 유화 ‘영국 궁전의 프랑스 사신들’(1532년). 그림 아래에 그려진 이상한 물체의 실체를 보려면 그림 아래에 눈을 가까이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올려다보라. 사진제공 진중권
비밀은 시선의 각도에 있다. 그 책은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지면과 15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게 해서 봐야 한다. 실제로 눈을 지면 아래에 바짝 붙인 채 비스듬히 올려다보니, 놀랍게도 그 먹줄들이 알파벳으로 변한다. 읽어 보니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의 독일어 단어다.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게 길게 늘려 쓴 후 눈의 각도를 조절하고 그 길이를 단축해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게 만드는 트릭. 이를 왜곡상(anamorphosis)이라 한다.
○ 일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왜곡상
재미있는 발상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미 오래 전에 누군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왼쪽 아래 그림을 보라. 언뜻 보면 클레 혹은 몬드리안의 추상화처럼 보인다. 이제 눈을 그림(?) 바로 아래 갖다 대고 한쪽 눈을 감은 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라. 아마 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작품을 만든 이의 이름이다. 이제 그림을 90도 회전해 측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저 혼돈 속에서 불현듯 또 다른 글자들이 떠오를 것이다.
 |
이 ‘뒤틀기 놀이’는 그저 재미있는 놀이에 불과한 게 아니다. 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고속도로에서 길이 갈리는 지점에는 아스팔트 위에 방향을 표시하는 글자가 씌어 있을 것이다. 그 글자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게 늘어져 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시선은 지면과 10∼15도 정도의 좁은 각도를 이루고, 그 결과 길게 늘어진 글자들이 단축되어 제 꼴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단축 왜곡상의 제작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슬라이드 필름을 스크린 위에 투영한다. 수직으로 선 스크린을 뒤로 서서히 눕히면 이미지가 길게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비스듬하게 늘어진 이미지의 윤곽을 따면, 바로 왜곡상이 얻어진다. 하지만 스크린이 굳이 평면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 가령 그 필름의 이미지를 종이로 만든 원기둥의 표면 혹은 원뿔의 꼭짓점 위로 투사한다고 하자. 그럼 알아보기 힘든 또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얻어질 것이다.
왜곡상의 기술을 발명한 것은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 그가 제작한 최초의 왜곡상도 이미지를 평면이 아닌 원기둥에 투사한 것이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 이미지를 구하지 못했으니 다른 것을 보자. 오른쪽 맨 위의 그림은 원뿔 왜곡상이다. 저 그림을 가위로 오려서 깔때기 모양으로 말아 접으라.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원뿔을 꼭짓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라. 그러면 기괴하게 왜곡된 이미지의 제 꼴이 드러날 것이다.
○ 왜곡과 참모습의 숨바꼭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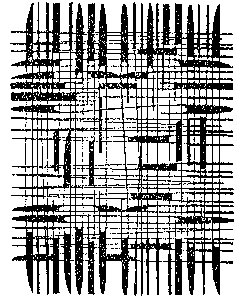 |
왜곡상의 기술은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발견되었으나 널리 유행한 것은 17세기였다. 왜곡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학이나 원근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당시 이 시각적인 놀이는 귀족, 승려, 인텔리 등 상류층이 즐기던 지적 유희였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와 인쇄술의 발달로 복제화의 대량 보급이 가능해지면서, 왜곡상은 점차 서민층의 놀이로 모든 계층에 퍼져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왜곡상이 그저 놀이에 그쳤던 것은 아니고, 제법 진지한 동기에서 제작된 경우도 있었다. 가령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에는 아직도 왜곡상을 이용한 벽화가 남아 있다. 떨어져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평화롭기 그지없는 항구의 풍경일 뿐이다. 하지만 그 그림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벽의 왼쪽 끝에 바짝 붙어서 보면 느닷없이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 풍경 안에 예수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 벽화는 왜곡상의 표현력을 보여 준다. 왜곡상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뒤로 보이지 않는 사물의 참모습을 담고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기발한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이 열린다. 실제 서양 회화에는 왜곡상을 이용해 제작한 것들이 더러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독일 르네상스의 거장 한스 홀바인의 작품일 것이다. 그의 유화 작품 ‘영국 궁정의 프랑스 사신들’은 언뜻 보면 평범한 초상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는 슬쩍 눈에 띄지 않는 삶의 진리가 드리워져 있다.
영국의 궁정으로 간 프랑스의 두 사신. 둘은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고 한다. 그 우정을 기리려고 화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초상을 그리게 했고, 덕분에 그 두 사람은 가고 없지만 그 우정만은 영원히 남게 된 것이다. 저 두 사람 사이에 아래쪽으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게 보일 것이다. 눈을 그림 왼쪽 아래에 바짝 붙여서 대각선으로 올려다보면, 그 물체의 정체가 드러난다. 두개골.
○ 죽음을 기억하라
저 두개골을 흔히 바니타스(vanitas)라 부른다. ‘바니타스’란 원래 ‘헛되도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의 상징이다. 흔히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망각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죽음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삶의 진정한 본질은 죽음을 향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르네상스 말기에 등장해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유행한 바니타스의 상징은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는 중세적 도덕의 근대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 삶은 허상이고, 죽음은 실체다. 그렇다면 저 그림 속에서 세상에 대해 참말을 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 겉으로 보이는 삶의 화려한 외관? 아니면 눈에 띄지 않게 슬쩍 스쳐 지나가는 죽음의 그림자? 우리는 흔히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고 말하나, 아주 가끔은 왜곡이 진리를 말하기도 한다.
진중권 평론가·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의 ‘놀이와 예술’ 5회는 ‘거울놀이’입니다.
진중권의 ‘놀이와 예술’ >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32
-

프리미엄뷰
구독 15
-

김순덕 칼럼
구독 385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진중권의‘놀이와 예술’]視覺의 장난, 왜곡상 - 거울놀이](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