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쥐세페 아르침볼도의 ‘요리사’. 쟁반 속 고깃덩어리들 사이로 투구를 쓴 병사의 얼굴이 연상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의 위 아래를 바꾸어서 보면 또다른 옆 얼굴이 나타난다. 사진제공 진중권
나는 학교 철봉대에 두 다리를 걸치고 거꾸로 매달리기를 좋아했다. 지구를 짊어진 아틀라스의 완력보다 거꾸로 본 세상의 시각체험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나 할까? ‘물구나무서기를 못 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멋있게 들린다. 어쨌든 철봉에 매달려 바라본 세상에서는 모든 사물이 고드름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자라고 있었다. 샤갈도 어린 시절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보았을까? 그의 어느 작품에서는 마을의 집 두 채가 물구나무서 있다.
아이들만 물구나무서는 게 아니다. 가끔은 낱말이나 문장도 물구나무를 선다. 가령 ‘곰’이 물구나무서면 ‘문’이 된다. 한편 말을 뒤집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다시 합창 합시다’라는 문장은 거꾸로 세워도 역시 ‘다시 합창 합시다’가 된다. 이런 장난은 영어에도 존재한다. 가령 ‘Was it a cat I saw?’라는 문장은 앞뒤 어느 쪽으로 읽어도 같은 뜻이 된다. ‘내가 본 것이 고양이였던가?’ 이런 것을 ‘팰린드롬(palindrome)’, 우리말로는 ‘회문(回文)’이라 부른다.
애들만 이런 장난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려시대의 문신 이규보 같은 이는 한문으로 회문 시를 지었다. 그가 지은 ‘미인원(美人怨)’이라는 시를 뒤집어 읽으면 거기서 또 다른 시가 나온다. 대개는 바로 읽으나 뒤집어 읽으나 같은 뜻이 되는 것만을 회문이라 부르나, 꼭 그런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뒤집어 읽어 뜻만 통하면 회문으로 간주한다. 사실 뒤집었을 때 뭔가 다른 의미가 나타나야 표현의 맛이 살지 않겠는가.
○ 뒤집어 보기의 반전
 |
가령 1500년대 후반에 그려진 이탈리아의 괴짜 초상화가 아르킴볼도의 그림을 보라. 은빛 쟁반 위에 삶은 돼지와 닭으로 보이는 고깃덩어리가 놓여 있다. 저 요리 속에는 인간의 얼굴이 감춰져 있다. 요리의 뚜껑은 병사의 투구, 쟁반은 갑옷의 칼라, 그 사이로 기괴한 얼굴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제 그림을 뒤집어 보라. 살짝 눈을 옆으로 돌려 당신을 쳐다보는 또 다른 사내의 기괴한 얼굴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그냥 본 이미지와 뒤집어 본 이미지 사이에 ‘대조’를 도입하면 더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령 종교전쟁이 한창이던 1600년경에 제작된 다음 그림을 보라. 저 독특한 모자로 보아 그림 속의 인물은 가톨릭교회의 수장임에 틀림없다. 이제 그림을 물구나무 세우면 거기서 또 다른 자의 형상이 나타난다. 머리에 달린 양 뿔로 보아 사탄임에 틀림없다. 칼뱅주의 신교도들의 눈에 교황은 악마로 보였던 모양이다.
 |
1700년경에 제작된 그림은 똑같은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여 좀 더 경건한 메시지를 전한다. 긴 수염을 한, 저 잘 생긴 사내의 얼굴을 뒤집으면 해골이 나타난다. 이로써 삶의 본질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이 폭로된다. 사실 삶 자체가 점진적인 죽음이다. 우리는 살면서 매일 조금씩 죽어가지 않는가. 여기서 물구나무서기는 이 무서운 허무함을 견뎌내는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의 정신적 훈련이 된다.
1800년경에 그려진 풍자화를 보자. 당시 프랑스는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다. 그림 속의 사내는 구체제의 귀족으로, ‘혁명’의 물결이 곧 스러지고 반혁명(反革命)이 도래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다. 그림을 뒤집으면 화를 벌컥 내는 또 다른 사내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역시 귀족으로, 하늘이 내린 신분질서를 뒤엎은 ‘혁명’에 저주를 퍼붓는 중이다. 당시에는 발달한 인쇄술에 힘입어 이런 유의 풍자화가 유행했다고 한다.
 |
○ 물구나무서기의 대가들
현대 예술은 추상으로 치닫는 바람에 이런 그림이 설자리가 좁다. 하지만 ‘뒤집기 그림(reversible picture)’의 전통은 20세기의 회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보라. 여기서는 이미지를 뒤집어 보는 수고를 거울 같은 수면이 대신해 주고 있다. 물 위에 뜬 세 마리 백조가 수면에 드리운 그림자는 놀랍게도 코끼리의 형상을 보여준다. ‘곰’이 물구나무서면 ‘문’이 되는 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시 합창 합시다’의 구조도 들어 있다.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 보라. 그러면 똑바로 보았을 때와 똑같은 이미지가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회문에는 뒤집어도 같은 것이 되는 경우와 뒤집으면 다른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달리는 이 두 가지 방식의 회문을 결합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장난으로 그가 어떤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그는 한 사물에서 불현듯 다른 사물의 이미지를 보는, 이른바 ‘편집증적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
때로 세상을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인류의 업적 중의 위대한 것들은 종종 물구나무서기의 산물이 아닌가. 가령 코페르니쿠스는 수천년 묵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모델을 거꾸로 세워 지동설을 만들어냈다. 칸트는 철학에서 시간과 공간을 인간의 머리 속에 집어넣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했다. 마르크스가 헤겔의 관념론 철학을 뒤집어 ‘사적 유물론’을 만들어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철학자 니체도 세상을 뒤집어 이른바 ‘가치전도’를 수행하려 했다.
 |
물구나무서기는 하릴없는 장난에 불과한 게 아니다. 정신과 기술의 위대한 창조자들은 능숙한 물구나무서기 선수들이었다. 그들은 역사가 답보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시기에, 상투적 시각, 익숙한 관점을 물구나무세워 인간정신의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구를 찾아내곤 했다. 마지막으로 난쟁이 조커의 수수께끼로 글을 마치기로 하자. 저 ‘퍼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림을 물구나무세워 보라. 평론가·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의 ‘놀이와 예술’ 8회는 ‘그림자놀이’입니다.
진중권의 ‘놀이와 예술’ >
-

횡설수설
구독
-

천광암 칼럼
구독
-

Tech&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진중권의 ‘놀이와 예술’]실루엣 판타지, 그림자놀이](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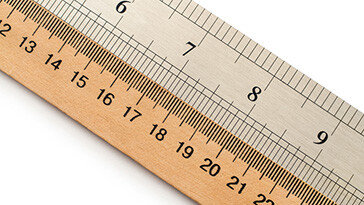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