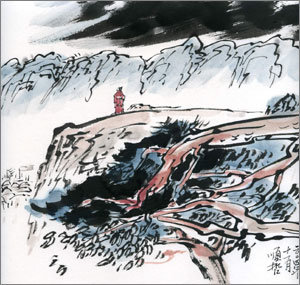
하지만 한신은 그 말을 입 밖으로 뱉어낼 수가 없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억눌러 한왕과 함께 떼밀려 가게 할 뿐이었다. 어쩌면 56만의 눈먼 욕망이 어우러져 뿜어내는 열기와 떼밀 듯하는 그 엄청난 힘에 압도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뒷날처럼 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다다익선]고 큰소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신의 군사적 재능이 더 여물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 한신에 못지않게 장량도 그 무렵부터 알 수 없는 망연함에 빠져들고 있었다. 남으로 내려갈수록 한왕 밑으로 들어오는 제후나 토호들은 늘고 군사도 폭발하듯 불어났으나 장량은 불안하고 막막해졌다. 심할 때는 그만큼 많은 적들 가운데 겹겹이 에워싸인 기분까지 들었다.
(이건 천하대세를 결정짓는 싸움을 앞둔 왕사(王師)의 모습이 아니다. 유융(有f)의 허(墟)나 목야(牧野)로 밀고 들던 탕무(湯武)의 군대는 결코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장량도 그렇게 중얼거리며 무겁게 한숨지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그도 한신처럼 입을 열어 그런 느낌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임진관을 나와 하수를 건넌 이래 한번도 꺾임 없이 부풀어온 한군의 기세와 잇따른 한왕의 승운(勝運)이 장량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 술 더 뜬 것은 진평이었다. 뒷날 진평은 특히 인간의 약점에 밝고 누구보다 그것을 잘 이용하게 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그의 재주는 제대로 다듬어져 있지 않았던 듯했다. 그는 진작부터 한왕과 비슷한 느긋함으로 세상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여간 눈치 빠르고 영악하지 않으면 이 같은 난세에 제후로 몸을 일으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제후들이 한번 싸워 보지도 않고 한왕을 따르는 것은 대세가 그리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나도 주인을 바로 찾아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왕처럼 불어나는 세력에 취해 은근히 그걸 즐기기까지 했다.
뒷날 돌이켜 보면, 사태를 꿰뚫어 보고 다가올 재난을 방비할 한신과 장량, 진평 모두가 어떤 야릇한 패신(敗神)에 홀려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누구보다 눈 밝은 그들이 몇 발짝 앞의 나락도 보지 못하고 앞사람의 발꿈치만 보며 내달은 셈이었다. 그리하여 셋 모두 무너지는 언덕 위의 돌 부스러기처럼 한왕과 함께 계곡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갔다.
하지만 나락은 금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왕이 이끈 제후군이 순수(巡狩)라도 하듯 느릿느릿 수양(휴陽)을 거쳐 우현(虞縣) 율현(栗縣)을 휩쓸며 지나가도 길을 막는 초나라 군사가 없었다. 들리는 것은 한왕과 그를 따르는 제후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승전의 소식뿐이었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고양이 눈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四. 흙먼지말아 일으키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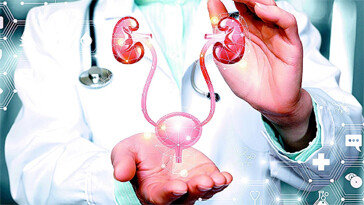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