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한들 ‘독일, 창백한 어머니’는 다소 낡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건 결코 25년이라는 물리적 시간 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의 독일과 그 10년 후 독일은 정치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길 것이다. 분단 상황에서 바라본 독일의 이야기를, 분단 상황도 아닌 지금에 와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언제나 그렇듯이, 영화 안에 담겨져 있다. 냉전의 끝, 그 지리멸렬한 분단의 막바지 상황에서 헬마 잔더스브람스 감독이 바라본 독일의 내면은 자신의 실제 어머니가 겪었던 기구하고 비루한 삶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그 지긋지긋한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또다시 ‘창백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창백한 이야기가 냉전이 걷히고 첨단 자본주의가 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통독 상황에서도 결코 낯설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시성(通時性)이 느껴진다. 독일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그 내면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영화는 새삼 느끼게 해준다. 더 나아가 역사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비슷한 경험의 민족들, 국민들에게 국가란 종종 ‘창백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결코 독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이며 우리의 비틀린 역사를 그리고 있는 영화다.
전쟁이 임박한 독일. 너도나도 나치스가 되던 시절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남들과 달리 당원이 되기를 거부하던 두 남녀 한스와 리네는, 자신들만큼은 전쟁 포화의 와중에도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 한스는 곧 전장으로 끌려가고 이후 리네는 참혹한 생활을 이어 나가게 된다. 유럽전선을 끌려 다니며 사선을 오가는 한스를 기다리던 리네는 전쟁통에 낳은 아이를 끌고 추위와 굶주림을 피해 이곳저곳을 전전한다. 패전 직후에는 점령군이었던 미군에게 강간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기다린 남편 한스는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잔인한 속물로 변한 채 집으로 돌아온다. 두 사람의 가정은 껍데기만의 평화일 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전쟁 때보다 더 가혹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리네는 결국 자살을 시도한다.
 |
‘독일, 창백한 어머니’는 ‘뉴 저먼 시네마’의 대표 격이자 마지막 영화쯤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뉴 저먼 시네마’는 종전 후 점령국 미국에 의해 무차별적이고 의도적으로 수입돼 독일 영화의 쇠퇴를 가속화했던 할리우드 영화에 맞서 1960, 70년대 젊은 독일 영화인들이 일으킨 일종의 영화운동이다.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이나 베르너 헤어초크, 폴커 슐뢴도르프 감독 등이 중심이 됐던 이 운동을 토대로 독일에서는 비로소 시대와 사회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작품들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이 젊은 영화인들은 “아버지 세대의 영화는 죽었다”고 선언함으로써 독일뿐 아니라 유럽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아버지 세대의 영화가 죽었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살부의식(殺父儀式)’이 필요할 것이다. 그 제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지난한 역사에 대해, 비록 안타깝고 짜증나는 일이긴 해도, 그것을 정면으로 다루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 ‘독일, 창백한 어머니’는 그렇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사회를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통과의례 같은 이야기를 해내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그리 거창하게 왈가왈부할 것 없을지도 모른다. 이 영화는, 전쟁통에 기구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금세 눈물을 흘리게 될 영화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위하여! 창백한 나의 조국을 위하여! 18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 가.
오동진 영화평론가 ohdjin@hotmail.com
오동진의 영화파일 >
-

특파원 칼럼
구독
-

월요 초대석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동진의 영화파일]‘바이브레이터’와 최근 日영화의 경향](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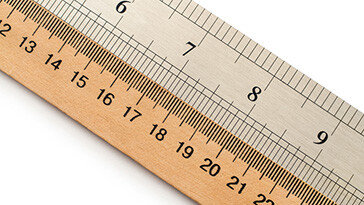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