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진우 칼럼]‘꽃제비’와 느릅나무
-
입력 2005년 5월 4일 18시 40분
글자크기 설정
‘규천아, 나다 형이다.’
딱 한 줄이다. 그러나 아픔의 여백(餘白)은 시제(詩題)인 ‘천(天)’만큼이나 넓고 아득하다. 그렇게 천공(天空)을 떠돈 시인의 절규는 함경북도 옛집 우물가 느릅나무에게 향한다.
‘나무/너 느릅나무/50년 전 작별한 나무/지금도 우물가 그 자리에 서서/늘어진 머리채 흔들고 있느냐…죽기 전에 못가면/죽어서 날아가마/나무야/옛날처럼/조용조용 지나간 날들의/ 가슴 울렁이는 이야기를/들려다오/나무, 나의 느릅나무.’
이제 월남 1세대는 거의 세상을 떴고, 그들의 한(恨)은 자손들의 기억에서조차 흐릿해져갈 것이다. 그러나 기억이 소멸하지 않는 한, 통일이 포기할 수 없는 꿈으로 남아 있는 한 북(北)은 밉고 싫어 안 보려 해도 안 볼 수 없는 ‘피붙이 동기간’일 수밖에 없다.
▼동족-주적의 딜레마▼
어린이날, 북녘의 ‘꽃제비’가 떠오른다. 진창이 된 장바닥에서 먹을 것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아이들,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부랑아들, 동상으로 발가락이 모두 잘려 나간 소년들, 그들이 ‘꽃제비’라니. 이름이 예쁜 만큼이나 참혹하다.
어린이들을 굶어 죽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다. 그 점에서 북한 정권은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말대로 ‘폭정(暴政)의 거점’이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표현대로 ‘폭군(暴君)’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선군(先軍) 사상’을 외쳐 댄다. “사상 혁명을 힘 있게 벌이는 일이 밖으로부터 침습하는 자본주의 사상·문화의 영향을 철저히 막고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기본 방도”(5월 1일자 ‘노동신문’)라는 것이다. 10년 사이 주민의 평균 수명이 5.5세 줄어들고 사망률은 3.6%포인트 높아진 터에 ‘선군 사상’이라니 기막힐 노릇이다. 이런 북한 정권을 ‘피붙이 동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족이자 ‘주적(主敵)’인 고약한 딜레마다. 이 혼돈은 곧 한국 사회의 ‘북을 바라보는 시각’의 분열로 나타난다. 친북(親北)-반북(反北) 갈등의 근원도 양립하기 어려운 ‘동족-주적’의 혼란에 있다. 지난 세월에 이런 혼란은 없었다. 북은 주적이었고, 동족의 시각은 용공(容共)이었을 뿐이다.
혼란스럽다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남북 체제경쟁은 끝났고 북을 포용할 만큼 남한 국민의 자신감도 커졌다. 그러나 혼돈은 정리해 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현 정부 및 진보좌파 그룹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입장부터 헤아리려 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 정권을 건드려서는 실익(實益)이 없고, 이야기해 봤자 주민 통제가 강화돼 오히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소리지만 이런 군색한 논리로는 북을 보는 시각의 혼돈이 정리될 수 없다.
▼對北시각의 혼돈 정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발언’에서 “핵과 미사일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한 북한의 주장에는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미국 네오콘(신보수)의 대북 강경책을 견제하려는 대통령의 뜻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혼돈을 정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에서 ‘자신’은 북한 정권인가 북한 주민인가. 핵과 미사일은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 국민까지 볼모로 한 북한 정권의 체제보위용일 뿐이다. 그렇다면 ‘일리 있는 측면’은 당연히 부적절하다.
 |
북핵(北核) 위기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지만 남한 정부가 그것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북한 정권의 전략적 결단을 이끌어 낼 카드도 마땅찮다. 여기에 북을 보는 시각의 혼돈마저 정리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핵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다.
전진우 논설위원 youngji@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전진우 칼럼]당신이 實勢인가](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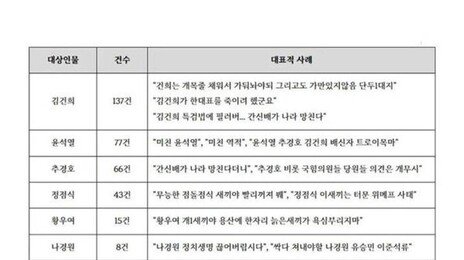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