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왕을 둘러업지 말고 부축하라. 동(東)광무의 초나라 군사들이 대왕께서 가슴을 맞고 혼절하신 걸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
군막으로 돌아간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화살촉도 뽑지 않은 채 뉘어져 있던 한왕이 한 식경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자 장량이 가만히 물었다.
“어떠십니까? 홀로 몸을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꼼짝할 수 없소. 화살이 용케 염통은 피해갔지만 갈비뼈를 맞힌 듯하오.”
한왕이 죽어가는 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러자 장량이 차갑게 받았다.
“그래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저물기 전에 동서 광무의 이쪽저쪽 모든 군사들에게 대왕께서 건재하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대로 저물면 서(西)광무는 오늘밤을 맞아서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한왕도 장량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워낙 상처가 무거웠다. 매사에 느긋한 한왕도 더는 견디기 어려운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넘어가면서도 발을 싸쥐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소? 그것으로도 아니 된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항왕은 병장기를 잘 알고 또 눈이 밝습니다. 당장은 속아 넘어갔을지 몰라도 끝내 속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물 때까지 대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자신의 계책이 맞아떨어진 줄 알고 반드시 야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저편은 몇 배나 기세가 올라 서광무로 기어오르겠지만, 우리 군사들은 사기가 꺾여 끝내 버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량은 아픈 한왕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겁을 주고 윽박질렀다. 한왕이 가만히 가슴께를 눌러보다가 다시 숨 넘어 가는 듯한 비명을 지르더니 장량에게 물었다.
“저물려면 얼마나 남았소?”
“이제 반시진도 남지 않은 듯합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러자 한왕이 이를 악물고 방 한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죽간(竹簡)을 가져다가 내 가슴에 두르고 띠로 단단히 동인 뒤 전포를 입히라. 그리고 안장에 적이 알아보지 못하게 등받이를 세우고 나를 묶은 뒤에 갑주로 가리라.”
시중들던 병사들이 그대로 했다. 하지만 상처가 무거워서인지 한왕은 몇 번이나 비명 같은 신음에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등받이를 한 말 안장에 올랐다. 어느새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를 등지고 한왕이 다시 서(西)광무 꼭대기의 진문을 나서자, 그를 알아본 한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러 반겼다.
한편 패왕 항우는 한왕이 쇠뇌에 맞고도 부축되어 제 발로 걷는 걸 보고 적이 실망했다. 그러나 그 뒤로도 한동안이나 한나라 진중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는 걸 보자 다시 슬며시 의심이 들었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인터뷰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이원주의 날飛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七.烏江의 슬픈 노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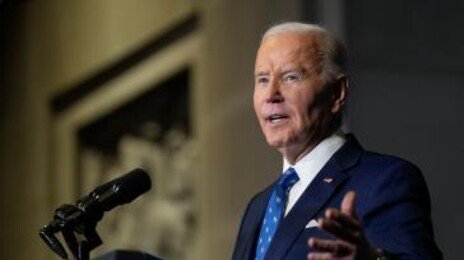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