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의 모험 /서동욱 지음·민음사
소통은 나를 구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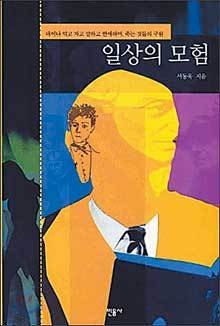
《“삶은 완성되는 법을 모른다. 그저 그렇게 끝도 없이 흘러왔던 대로 가버리는 어리석고 자질구레한 ‘일상사’가 백치의 머리통 같은 생을 채우고 있을 뿐이다…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다른 자리도 없다는 듯 ‘일상성’ 속에 있다. 먹고 자고 날로 연애하고 타인의 육체를 애무하고 새끼들을 낳고 미지의 것을 더듬듯 덧없이 글을 쓰며 한 닢의 동전을 떨어뜨리고 임종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한 번의 성교나 한 잔의 맥주를 꿈꾸는 그런 일상 말이다.”》
1923년 12월 죽음을 반년 앞둔 프란츠 카프카는 연인 밀레나에게 최후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더는 호흡을 할 수 없으며 보다 좋은 또는 보다 나쁜 시기가 오기를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쓰면서도 “누군가 맥주를 힘차게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일상에 대한 욕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죽음이 생을 갉아먹을 대로 갉아먹어 더는 작은 삶의 조각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삶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빛나는 법이 없다.
일상은 지루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상에 갇혀 생을 마감한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나왔는지 모른다. 이 책은 일상이 평범하다고 아무런 성찰 없이 지낸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구원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일상의 소통에서 구원의 질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통을 위해 고안된 도구가, 도구로서의 존재를 넘어 오히려 주체를 익명의 늪 속으로 실종되게 만들어 ‘소통의 본래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다. 소통의 본래성 즉 ‘말함’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먼저라고 말한다.
저자는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말을 빌려 “(말함과 연결된) 타인과의 만남은 나를 나의 유한성 바깥의 무한(타인)을 향해 초월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설명한다. 또 자아가 바깥의 미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주체성의 모험’으로 불릴 만하다고 평가한다.
우리가 마주보는 애인의 얼굴은 어떤가. 눈과 코와 같은 가시적인 것이 타인 그 자체와 같은 비가시적인 것을 계속 지시한다는 점에서 ‘아이콘’이다. 타인의 얼굴이란 근본적으로 그 어떤 ‘무한에 대한 욕망’이 향하는 곳이라는 것을 연애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도 없다면서 저자는 시를 한 편 끌어 들인다.
시를 통해 저자는 “지금 애인의 얼굴을 향한 시선이 결코 쉬지 못하는 까닭은, 보이지 않고 끝도 없는 무한을 더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삶의 장면들을 끌어내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인 ‘소통, 잠, 악마, 자기기만, 유령, 관상술, 얼굴, 패션, 웰빙, 이름, 족보, 애무의 글쓰기, 해방의 글쓰기, 노스탤지어, 외국인, 춤, 예언’에 숨어 있는 철학적 질문들을 탐색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대학새내기 철학입문서’ 20선]처음 읽는 서양철학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0/03/17/26899234.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