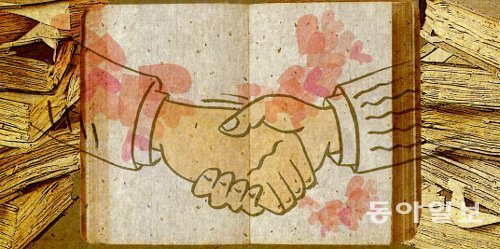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그녀는 늘 지갑이 얄팍했다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그 나머지를 위해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계속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네. 편의점 계산대에서 새벽을 맞을 때마다 그녀는 하루하루 자신의 용돈 기입장에 앞으로 벌어야 할 돈과 모자란 돈을 적어나갔다네. 스무 살, 맨드라미 같은 봄날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광화문 대형서점에 나가 오랫동안 책을 훑어보는 일이었다네.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대형서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설책과 시집과 희곡 책을 읽어나갔다네. 사고 싶은 책들은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용돈기입장의 숫자들을 떠올렸다네. 사월이 가고, 오월이 가도록, 그녀는 단 한 권의 책도 사지 못한 채, 외롭고 쓸쓸하게, 숫자들의 목에 긴 줄을 매달아, 터덜터덜 기숙사까지 걸어오곤 했다네.
그러나, 어쩌나. 그녀의 지갑엔 당장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돈도 남아 있지 않았다네. 책을 놓고 돌아서서 몇 걸음 떼다 보면 다시 그 책 앞에 가 있고, 서점을 몇 바퀴 돌아도 다시 그 책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네. 해서, 그녀는 생애 최초로 책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네. 가슴은 떨렸지만, 어쩌나. 그 책을 가져야만 마음이 진정될 것만 같았다네. 손끝이 바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꾹 참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낡은 가방 속에 책을 넣었다네. 한 발, 두 발, 서점 출입문을 향해 걸어 나가던 그녀의 마음은 아득해져갔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려 노력했다네. 저 문만 나가면, 저 문만 나가면, 그녀는 이를 앙다문 채 그렇게 속엣말을 했다네. 그리고 막 출입문을 나서려던 찰나, 누군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네.
2. 그 남자의 경우
첫 책을 낸 그는 사흘 내내 광화문 대형서점에 나가 자신의 책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첫 독자를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었다네. 삼 년 내내 붙잡고 있던 소설이었다네. 출판사를 찾지 못해 이곳저곳 헤매다가, 간신히, 그야말로 간신히, 세상에 나온 책이었다네.
그렇게 닷새가 지난 오후 무렵, 한 여자가 그의 책을 훑어보기 시작했다네. 그 모습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네. 기다렸던 인연이 찾아온 것만 같았다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녀는 들고 있던 책을 그 자리에 놓고 긴 한숨만 내쉬었다네. 자리를 떴다가 한참 후에 다시 책 앞에 돌아오기를 반복했다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네. 그녀는 쉬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네.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 떨려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그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책을 가방 안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네. 자신의 첫 책을, 훔쳐가는 것을, 그는 보았다네. 하지만 어쩐 일일까? 그는 화가 나지도, 노여움이 일지도 않았다네. 마치 자신이 책을 훔친 것처럼, 그것을 들킨 사람처럼, 가슴만 뛰었을 뿐이라네.
그녀는 한 발 한 발,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갔고, 그 뒤를 서점 직원 한 명이 따라가는 것이 보였다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네. 그는, 서점 직원보다 더 빨리, 이 사람 저 사람과 어깨를 부딪쳐가며, 그녀를 향해 뛰어갔다네. 머릿속은 계속 아득해져 갔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네. 그리고 다짜고짜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출입문을 밀치고 뛰어나갔다네. 어쩐지 자신이 원고지가 아닌, 삶 속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네. 그가 낸 첫 책의 제목은 ‘마주잡은 두 손’이었다네.
이기호 소설가
-
- 좋아요
- 2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1개
![[이기호의 짧은 소설]아들의 바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4/11/26/68171469.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