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50년, 교류 2000년/한일, 새로운 이웃을 향해]
[제2부 조선통신사의 길]<9>가는 곳마다 몰려드는 사람들

《 조선통신사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구름처럼 몰고 다녔다. 1764년 열한 번째 통신사 서기(書記)였던 김인겸(金仁謙)은 기행가사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에서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렸다. 융단을 깔고 금병풍을 세우고 많은 여자들이 비좁게 앉았다. 아이는 앞에 앉히고 어른은 뒤에 앉았는데 통신사 행렬보다 많았으나 큰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아이가 울면 입을 손으로 막는 걸로 봐서 구경꾼들에게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적었다. 》
○ 육·해로 가리지 않고 사람들 몰려

1711년 오와리(尾張·지금의 나고야 일대) 번의 하급 무사가 쓴 ‘오무로 일기’에는 ‘일본 사람을 위해 통신사 일행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휘호를 써주었다’는 기록과 함께 ‘통신사 숙소 근처를 얼쩡거리다가 경고를 받았지만 새벽에 몰래 들어가 그림 4장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을 정도였다.
일본인들은 통신사들의 글이나 시를 금장식 병풍이나 비단 족자로 만들어 가보(家寶)처럼 받들었다. 통신사들이 묵었던 시즈오카(靜岡)의 청견사(淸見寺·세이켄지)나 하코네(箱根)의 조운사(早雲寺·소운지) 등 일본 각지의 사찰은 지금도 300∼4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쓴 글씨를 현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번 취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시문창화(詩文唱和)와 의학 전수

통신사는 오가키에 도착하면 전창사(全昌寺·젠쇼지)에 묵곤 했는데, 1711년 사행 때는 기타오 슌보가 찾아왔다. 자긍심이 대단해 웬만한 사람은 마중이나 배웅하지 않는다는 그는 통신사의 의원 기두문(奇斗文)에게 조선 약초인 사삼(沙蔘)과 만삼(蔓蔘)의 구별법을 포함한 필담을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의학서를 썼다. 1748년에는 자신의 다섯 아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통신사를 만나 조언을 청할 정도였다.
당시 일본에는 조선 의학서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았다. 특히 허준의 동의보감에 대한 인기가 대단해 에도 막부는 허준의 동의보감을 1723년 일본에서 한자 원문 그대로 발간할 정도였다. 1682년 사행 때 숙종은 “의술은 인술이므로 일본을 많이 도와주라”면서 내과 외과 잡과 약과 침구과 등 국내 제1급 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9월 초 찾은 전창사 인근에는 조선통신사 일행이 배다리(배를 이어 만든 임시 다리)로 건넜을 수로가 지금도 남아 있었다. 당시에는 승려가 100여 명이나 되는 큰 절이었지만 2차대전 때 미군 공습 등으로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전창사는 통신사 접대를 위해 1764년경 대규모로 절을 증축했는데, 당시 설계도가 아직 남아 전해진다.
후아 에메이(不破英明) 주지 스님은 철로 만든 오래된 작은 찻잔용 삼발이를 하나 보여 주며 “조선통신사가 초와 밀랍을 이용해 주물 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인근 미즈호(瑞穗) 시가 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번성했다”고 말했다. 조선통신사가 전해 준 기술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시즈오카에 있는 청견사는 해안의 절경지에 자리한 데다가 조선과의 화해를 요청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해 일본 측이 거의 매번 통신사 숙소로 지정한 곳이라 70여 점에 달하는 시와 편액 등 우리 선조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9월 초 이곳을 찾았을 때 본당과 종루 건물 현판은 대부분 아직도 통신사들이 써 준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당에 걸린 ‘興國(흥국)’이라는 편액에는 ‘朝鮮(조선)’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1988년까지만 해도 통신사 유물인지 몰랐다가 재일동포 사학자 김양기 전 시즈오카대 교수에 의해 조선통신사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 김 교수는 기자에게 “버젓이 ‘朝鮮’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었지만 조선통신사 흔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조선과 일본의 교류 역사는 묻혀 있었다”고 말했다.
목적지인 에도와 가까운 가나가와(神奈川) 현 하코네에 있는 조운사에도 절 대문에 큼지막하게 ‘金湯山(금탕산)’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1643년 통신사 일행 중 사자관(寫字官·글씨를 잘 써 필사를 담당)을 맡았던 설봉 김의신의 글씨다. 절에는 하코네 인근의 10가지 풍광을 보고 지은 ‘금탕산 조운선사 십경’이라는 시도 두루마리 형태로 깨끗하게 보관돼 있다.
○ 민속으로 남은 ‘조선통신사’
쇄국정책을 쓰던 에도 시대에 조선통신사는 사실상 유일한 외국사절단이었기에 더더욱 일본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길을 비우라’는 의미의 청도(淸道)기를 앞세운 조선통신사 행렬은 당시 일본 사람들은 평생에 몇 번밖에 볼 수 없는 귀한 볼거리였다. 나팔과 북소리가 울리고 소동(小童)은 행렬이 지루하지 않도록 춤을 췄다. 말 위에서 무예를 보이는 마상재(馬上才)도 펼쳐졌으니 일본 대중에게는 인상 깊은 공연과도 같았을 것이다. 특히 소동의 길게 땋은 머리카락과 조선 사람들이 즐겨 쓴 모자는 일본에선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모여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조선통신사 행렬은 일본의 축제(祭·마쓰리) 문화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오가키 시 다케시마(竹島) 정의 조센야마(朝鮮輪·조선통신사 행렬을 그대로 본뜬 마차)가 대표적이다. 9월 초 찾은 오가키 시 향토민속박물관 자료실에는 ‘朝鮮王(조선왕)’이라고 쓰인 큰 깃발과 행렬에 등장하는 왕 인형 등이 전시돼 있었다. 상업적으로 성공해 부자동네였던 다케시마(竹島) 정에서는 조선통신사의 모자도 정교하게 만들고, 모자에 꽂힌 깃도 공작 털로 만들었다고 한다. 전시관의 후쿠다 에이치로(福田榮一朗)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다케시마 정에서는 나고야까지 사람을 보내 통신사 행렬을 그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에도 시대 이후 메이지 정부 때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인 신도(神道)와 관련 없는 축제 행렬을 금하자, 다케시마 정 주민들은 가장 행렬은 그대로 유지한 채 조선왕 깃발 대신 다른 신(神) 이름을 적은 깃발을 만들어 조센야마를 보존했을 정도였다.
통신사 관련 물품들도 기념품으로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다. 통신사 인형을 비롯해 촛대 연적 접시 등 다양한 물건이 만들어져 팔렸다. 지금도 히로시마(廣島) 현 하리코 인형 중 ‘나팔 부는 남자’와 같이 통신사를 모델로 한 인형은 기념품으로 제작돼 팔리고 있다.
○ “이런 야만의 나라에 부를 내리다니”
이런 파격적인 환호와는 별개로 통신사들은 일본에서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조선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도시들이 잘 정비돼 있었기 때문이다.
1719년 사행록인 해유록(海游錄)을 쓴 제술관 신유한(申維翰)은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요도가와(淀川) 강을 따라 인부들이 밧줄로 끄는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변 제방이 잘 정비돼 있고, 건물이 정교하고 깨끗한 것을 보고 이렇게 적었다. ‘한탄스럽다. 부귀영화가 잘못되어서 이런 흙으로 빚은 꼭두각시 같은 자들에게 돌아갔으니…”라고 적었다. 전쟁을 일으킨 야만의 나라에 이렇게 부가 축적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1643년 통신사 부사(副使·통신사의 부책임자)로 일본에 갔었던 조경(趙絅)은 ‘하코네 호수’라는 시에서 호수의 푸른 물을 피로 물들이는 상상을 하며 절치부심하기도 한다.
총 12회에 걸친 조선통신사는 초기 3회까지는 일본의 국서에 답한다는 회답(回答)과 조선인 포로를 데려오는 쇄환(刷還)의 임무가 강했다. 그래서 ‘통신사’가 아닌 ‘회답 겸 쇄환사’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 임무 수행도 쉽지 않아 통신사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1617년 사행 기록에는 ‘일본 측은 포로를 찾는 일에 시늉은 하지만 실제로는 현지 사람들과 입을 맞추고선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에 더 화가 난다’는 글이 보인다.
결국 4회째부터는 ‘통신사’라는 명칭을 쓰면서 에도 막부의 쇼군이 새로 자리에 오르는 것과 같이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만 통신사를 보냈다.
오가키·시즈오카=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한일, 새로운 이웃을 향해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구독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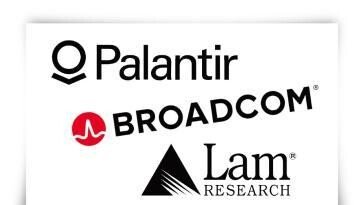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