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디아나존스들] <6회>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 발견…
배병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솔직히 다보탑이나 석가탑 해체보수 때에도 느끼지 못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실수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4일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 서쪽 석탑 해체보수 현장. 석탑 1층 기단 위에서 첫 번째 심주석(心柱石·탑의 중심 기둥 돌)을 바라보던 배병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56)은 떨리는 목소리로 7년 전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발견 당시를 회고했다. 사리장엄구는 사리를 담은 항아리(사리호·舍利壺), 사리를 모시게 된 경과를 기록한 사리봉영기(舍利奉迎記), 부처에게 바치는 공양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배 소장이 “여기서 희대의 유물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옛 기억을 되짚는 동안 현장 인부들은 쉴 새 없이 목봉(木棒)을 내리쳐 상층 기단부의 흙을 다지고 있었다.
2009년 1월 14일 오전에도 이곳은 해체보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두 번째 심주석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순간 배병선(당시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단장)과 연구원들은 저절로 ‘동작 그만’이 됐다. 살짝 벌어진 심주석 틈 사이로 1370년 동안 갇혀 있던 황금빛이 영롱하게 빛났다. 사리장엄구였다. 통상 심주석 아래 심초석(心礎石)에 들어 있는 사리장엄구가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예상 밖이었다.

심주석 안 26.5cm 깊이의 구멍(사리공)에는 금으로 만든 사리호가 온갖 구슬들에 파묻힌 상태였다. 첫눈에 봐도 지금껏 발굴된 백제 금속 유물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수습팀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유물을 꺼내는 순서를 정하는 일이었다. 사리공에는 사리호, 금으로 만든 사리봉영기, 은으로 만든 관식(冠飾), 청동합(靑銅盒), 금 구슬, 유리구슬, 유리판 등 9900여 점에 달하는 유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안치된 순서와 반대로 유물을 꺼내야 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워낙 좁은 공간에 유물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굴절거울 등을 동원해도 안치된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사리장엄구의 핵심인 사리호와 사리봉영기 가운데 무엇을 먼저 꺼낼지 의견이 엇갈렸다. 배병선은 고민 끝에 사리호부터 꺼내기로 결정했다.
금 구슬을 꺼낼 땐 떨어뜨릴 것을 우려해 핀셋 대신 양면 접착테이프를 붙인 막대기로 하나씩 건져 올렸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외부 공기에 노출된 유물의 손상을 막으려면 신속한 수습이 필요했다. 이틀에 걸쳐 밤을 꼬박 새우면서 강행군을 벌였다. 배병선은 발견부터 수습 완료까지 사흘 동안 6시간만 자고 버텼다.
사리봉영기의 명문은 백제사에 대한 해석을 바꿨다. 특히 ‘우리 백제 왕후는 좌평(佐平·백제 귀족) 사택적덕의 딸로 재물을 희사해 가람을 세우고 기해년(639년) 정월 29일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는 내용은 백제 최대 사찰인 미륵사의 건립 연도와 발원 주체를 확인시켜 줬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 명문을 근거로 ‘선화공주의 발원으로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삼국유사 기록은 잘못이며, 선화공주는 가공의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선화공주 실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미륵사가 ‘3탑 3금당’의 독특한 구조를 가진 사찰이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현재 흔적만 남아 있는 중앙 목탑 터에 선화공주의 사리봉영기가 따로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김낙중 전북대 교수(고고학)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보고서’에서 “조성 연도가 확인된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다른 백제 유물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변천 과정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인디아나존스들
[5회]20년만에 찾은 금관가야 왕릉… “이게 꿈인가” 등골이 오싹
[4회]2000년 전 붓과 삭도… 한반도 문자문명 시대를 알리다
[3회]석달간 맞춘 토기 조각… 몽촌토성의 비밀을 밝히다
익산=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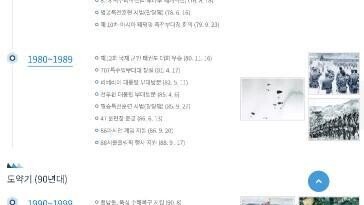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