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익 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

김병익 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78)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을 보여줬다. 김 고문 부부와 시인 마종기 씨 부부, 가수 장사익 씨 등과 함께한 장면이었다. 그는 자신과 아내만 나오도록 편집해 자녀들에게 단체 메시지로 보내줬다고 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새로운 것에 대한 김 고문의 호기심은 왕성하다. 최근 낸 산문집 ‘기억의 깊이’(문학과지성사)에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성찰이 풍성하다. 그 성찰은 물론 기자로, 평론가로, 번역가로, 편집자로 산 그의 활자에 대한 고민이다.
22일 만난 그는 “문자로 평생을 보냈다”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아날로그식 문자 활동은 비관적으로 보인다”고 미래를 내다봤다. “20세기 전반만 해도 문학은 모든 지적인 예술 형식의 중심이었지만 이제 변방으로 몰리고 있다. 작가도 단독의 창작자라기보다는 종합예술의 스태프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때 21세기에 들어서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문학과지성사 대표를 그만둔 게 2000년이기도 하고. 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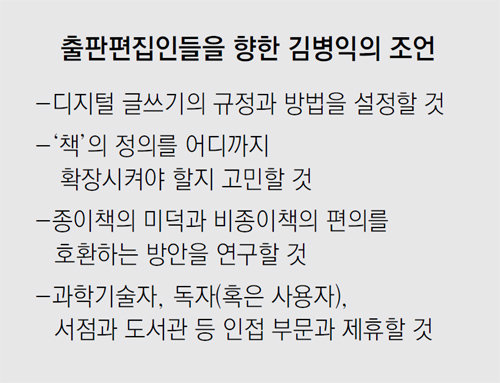
다양했던 활동 중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김 고문에게 물었다.
“1970년 ‘문학과지성’의 계간 편집동인으로 참여해 2000년까지 일했으니 내 생의 3분의 1을 그 이름을 짊어졌다.” 10대 때 장래에 대해 꿈꾼 것도 ‘무엇이 되고 싶다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다’였다는 그의 말이 이어졌다. “가까운 친구들과 동아리로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살고 싶었다. 그 꿈이 이뤄진 것 같다.” 김현 김치수 김주연 또래 평론가들과 함께 계간지를 꾸리고 문학 책을 만들어 온 그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이면 시인 황동규 정현종 씨, 소설가 김원일 씨 등 동년배 문인들과 만나 바둑을 두고 담소를 나눈다.
노년의 나날은 어떨까? 그는 ‘완전한 자유인의 시간’이라면서 오전엔 신문을 읽고 오후에 책을 보고 저녁엔 야구 경기를 본다. 두산 베어스의 팬인 그는 경기가 없는 월요일은 심심하다며 싱긋 웃음 지었다.
인터뷰 말미에 김 고문은 “어떤 전통은 완고하게 지키면서 어떤 건 까맣게 잊더라”고 했다. “좋은 원두가 그렇게 많다는데 커피는 인스턴트커피가 제일 맛나더라. 그런데 펜으로 원고지에 글 쓰는 건, (그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못하겠더라.” 그의 얘기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날로그의 증언’으로 들렸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요즘! 어떻게?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진영 칼럼
구독
-

트렌드 NOW
구독
-

변종국의 육해공談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요즘! 어떻게?]“동화 작가 아닌 ‘그림책 작가’ 이름 찾아야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7/07/79061174.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