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선의 잡史]세금-부역 대신 왕실에 ‘꿩’상납… 숙종땐 1800명 등록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매사냥꾼 ‘응사’

“매사냥꾼은 팔뚝에 매를 얹고 산을 오르고, 몰이꾼은 개를 몰고 숲을 누비네. 꿩이 깍깍 울며 산모퉁이로 날아가니, 매가 회오리바람처럼 잽싸게 날아오네.” ―정약용, ‘和崔斯文游獵篇(최 선비가 사냥을 보고 지은 시에 답하다)’에서
옛날 매를 길들여 꿩을 잡는 이들을 매사냥꾼, 곧 응사(鷹師)라고 했다. 매사냥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한다. 고구려 벽화에 매사냥 그림이 있고, 백제의 아신왕과 신라의 진평왕은 매사냥 마니아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의 충렬왕은 응방도감(鷹坊都監)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매사냥꾼을 육성했다. 하지만 폐단이 만만치 않았다. 매사냥꾼들은 매를 뒤쫓느라 논밭을 짓밟고, 달아난 매를 찾는다며 민가에 난입했다. 응방을 폐지하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응방은 폐지와 복구를 거듭하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태조와 태종도 매사냥을 즐겼다. 세종대왕조차 가끔 매사냥에 나섰다. 신하들이 그만두라고 건의하자 세종은 역정을 냈다. “신하들도 매를 많이 기르는데, 임금은 새 한 마리도 못 기르는가?” 왕실의 응방은 역시 매사냥에 탐닉했던 연산군이 왕위에서 쫓겨나고서야 비로소 없어졌다.
고려시대 문인 이조년의 ‘응골방(鷹골方)’, 조선 안평대군의 ‘고본응골방(古本鷹골方)’ 등은 우리 매사냥 문화의 수준을 보여준다. 매 사육 및 훈련 방법을 설명한 책도 있다.
먼저 산 닭을 미끼로 매를 그물로 잡는다. 잡은 매를 어두운 방에 두고 수십 일 동안 천천히 길들인다. 손에 든 먹이를 받아먹게 하면서 부르면 오게 만든다. 매가 사람에게 친숙해지면 슬슬 사냥을 나간다. 날이 덥거나 따뜻해도 안 되고, 초목이 무성한 계절에도 안 된다. 봄에는 오전, 가을과 겨울에는 오후, 대체로 초저녁이 좋다.
굶주리면 사냥을 못 하고 배가 부르면 날아가 버리니, 체중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병들면 약을 지어 먹이고, 추우면 고기를 따뜻하게 데워 먹여야 한다. 상전이 따로 없다. 이렇게 정성껏 길러도 오래 쓰지는 못한다. 길어야 3, 4년, 짧게는 1, 2년 안에 대부분 죽거나 달아난다.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의 잡史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조선의 잡史]호랑이 가죽 원산서만 한 해 500장 거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12/04/8756531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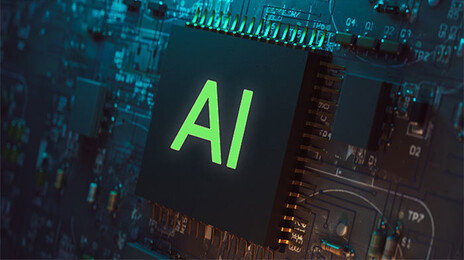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