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뉴스룸/노지현]청년 후보들의 ‘메기’ 효과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6·13지방선거에서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는 ‘구(區)의원 출마 프로젝트’였다. 전직 기자를 비롯해 동시통역사 서점주인 학원강사 회사원 등 20, 30대 청년들이 “구의원에 도전하겠다”며 꾸린 모임이다. 정치인 하면 공무원이나 판검사를 거쳐 정당에 들어가거나 아예 직업이 정당원인 경우만 주로 봤기에 이들의 ‘스펙’이 낯설었다. 이들은 정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모래알’이다. 물론 돈도 없다. 그래서 주말마다 모여 공약을 어떻게 가다듬을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공부했다. 일각에서는 “요즘 청년들 취업이 어렵다더니, 취업 수단으로 선거에 출마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없었다. 하지만 당락만으로 이들의 도전을 평가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당선자 2541명 중 30세 미만은 22명, 30세 이상∼40세 미만은 144명이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각각 6명과 8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젊은 사람이 크게 늘었다. 물론 지방선거 당선자의 대다수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 소속된 50대 이상이다.
서울 마포 나선거구(염리동·대흥동)에 출마한 차윤주 씨(36·여)는 18.6%를 얻어 2등과 303표 차로 아깝게 낙선했다. 기성정치나 정당에서 벗어난 ‘선택’을 원하는 유권자가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포스터는 기존의 포스터 문법과는 달랐다. 자전거 아마추어 대회의 경력을 쭉 써놓고 “강인한 멘털과 체력을 발로 뛰는 생활정치에 쏟아붓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이다. 휴대전화번호를 그냥 그대로 인쇄물에 넣거나,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를 써놓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명문대를 다니며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 외국어와 자격증 공부에 매달리며 치열하게 살았다. 또 사회 초년병 시절에는 ‘무언가’ 가진 듯한 윗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공이 있겠거니’ ‘실력이 있겠거니’ ‘아직 철없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겠거니’…. 그런데 30대 들어서면서 ‘이게 아닌데’라고 느끼게 됐다.
정치인이라고 다를까. 본인 소유 식당에서 온갖 구정 행사를 치르며 이득을 취하는 구의원, 지역행사에서 노인들 손만 잡아주면 표를 얻는 줄 아는 구태 정치인들, 외유성 출장 후 1장짜리 결과보고서를 내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내가 저 월급 받으면 100배는 더 일을 잘해 줄 텐데’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 변화의 새싹을 유권자가 키워준다면 더 많은 생활정치인이 나올 것이다.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회사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 애 키우며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바꿀 정책을 들고 나타날 수 있다. 기성정치를 바꾸는 ‘메기’로 말이다.
노지현 사회부 기자 isityou@donga.com
뉴스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 여기
구독
-

동아시론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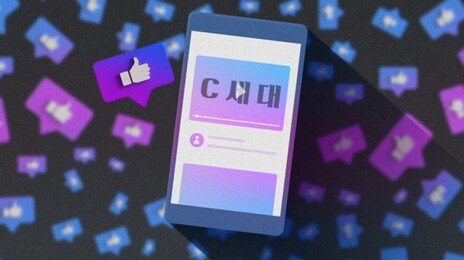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