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열려 7일 폐막한 ‘2019 서울모터쇼’는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모터쇼가 열린 10일 동안 63만8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과거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지나친 노출의 레이싱 모델들은 확 줄고 어린이들을 위한 자동차 안전 체험과 다양한 경품 행사가 늘면서 가족 단위의 행사로 손색이 없었다. 중견 전기차 업체들의 제품과 평소 보기 어려웠던 차량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는 의미도 깊다.
하지만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지능화된(Connected) 이동혁명(Mobility)’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얼마나 제대로 행사에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 전시회이자 자동차 업체들의 미래 자동차 기술 각축장이 된 국제가전전시회(CES)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량들 전시에 몰두했다. 얼핏 보면 자동차 영업점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를 대거 갖다놓은 전시장에 그쳤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 차량이라며 내놓은 전기차들도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2, 3년 전부터 국내에서 팔고 있는 차들이었다. 차량이 운전자 감정을 읽어내는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업체 직원이 관객 서너 명만 데리고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다. 완성차들과 섞여 있다 보니 관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다. 자동차와 IT를 접목하는 커넥티드와 5세대(5G) 자율주행 등을 선보인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들의 참여가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차라리 모터쇼 주제에 맞는 최신 기술과 차량만 따로 모은 공간을 만들었다면 주제가 돋보이기라도 했을 텐데, 모터쇼가 아니라 자동차 박물관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번 서울모터쇼엔 국산차 업체 6개사, 수입차 업체 14개사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만 대 이상을 판매한 아우디, 폭스바겐이 빠졌고, 미국 브랜드인 포드와 링컨, 캐딜락, 지프도 불참했다. 마세라티를 제외한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의 슈퍼카도 볼 수 없었다. 올해 1분기에 쌍용차 신형 코란도와 현대차의 신형 쏘나타 등이 서울모터쇼 현장에서 최초 공개됐으면 훨씬 보기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완성차 업체 임원은 “업체들이 왜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미 다 공개된 기술들만 나오는, 특별한 것 없는 모터쇼에 누가 참가하려 하겠느냐”며 “수억 원 써가며 부스 만들어서 본전도 못 찾느니 마음 같아선 서울모터쇼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변종국 산업1부 기자 bjk@donga.com
변종국 산업1부 기자 bjk@donga.com
현장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딥다이브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현장에서/김재희]이재민 마음 건강도 보살펴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04/09/9495747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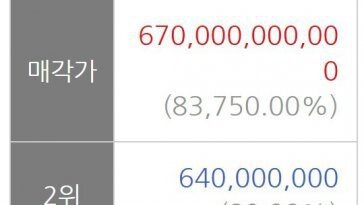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