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베스트셀러]
◇제3의 물결/앨빈 토플러 지음·김진욱 옮김/492쪽·1만5000원·범우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아이에게 서캐가 없도록 참빗으로 머리카락을 잘 빗겨주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은 대중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벗겨주는 것, 회충이 생기지 않도록 제때에 구충제를 먹이는 것이 필수였던 시대를 갓 빠져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아직 야간통행금지는 해제되기 전이었다.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었던 날에는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 마법처럼 컬러풀해진 화면에 경탄했다. 조용필이 매번 다른 색깔의 슈트를 입고 가요 프로그램에 매일매일 등장했다.
여중생이었던 나는 박찬숙 선수가 태평양화학에 소속돼 맹활약을 하던 농구 경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교보문고는 아직 없었고, 종로서적은 책 좀 읽는 이들의 메카였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살던 나에겐 132번 버스를 타고 종로2가에 내려 종로서적에 가서 한 층 한 층 둘러보며 천천히 책을 고르기 위해 외출하는 것이 유일한 여가활동이었다.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된 해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필독서 목록에 항상 적혀 있었던 책이기도 했다. 북한 출신 작가들의 책이 금서였고, 김민기나 양희은의 노래도 금지곡이었던 시절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토플러가 예견한 사회를 이미 익숙하게 체화하여 살고 있는 2019년이지만 이 칼럼을 쓰기 위해 다시 한번 ‘제3의 물결’을 정독했다.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이 쌍방향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예견, 그로써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결정권은 분산될 것이며 전체주의의 폭력성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는 예견 같은 것에 특히 시선이 머물렀다. 예견이 맞아떨어졌는지 아닌지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다른 것이다.
미래에 대한 그림은 언제고 그 형식은 대부분 맞았고 그 내용은 대부분 맞지 않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하여 발언권이 분산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면모와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 특히 그러하다. 나는 어쨌거나 80년엔 단발머리에 실핀을 꽂고서 TV 앞에 앉아 공포를 느끼던 아이였다. 유일한 정보 루트였던 TV 속 뉴스가 행하는 속임수가 가장 큰 공포였다. 지금은 당연히 아니다. 지금은 넘쳐흐르는 정보가 오히려 공포다. 정보가 정보를 덮고 쓸어가고 누락한다.
김소연 시인
그때 그 베스트셀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프리미엄뷰
구독
-

김순덕 칼럼
구독
-

동아경제 人터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책 한권이 쏘아올린 답사열풍… 역사는 살아 숨쉬었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10/12/9783999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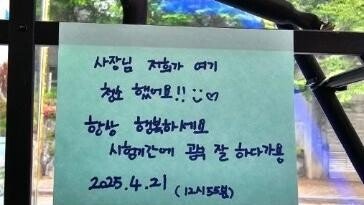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