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베스트셀러]
◇꼬마 니콜라 1∼5권/르네 고시니 글·장자크 상페 그림·윤경 옮김/855쪽·3만3000원·문학동네

‘꼬마 니콜라’는 소장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몇 번씩 거듭해서 읽었던 책이다. 내가 한 시절을 보냈던 공간들에서 손쉽게 나는 이 책과 재회하곤 했다. 교실의 학급문고에서, 카페의 창가에 마련된 자그마한 서가에서, 친구네 방에서….
언제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읽다가 그만 읽어도 남는 갈증이 없었다. 무엇보다 무해한 듯했다. 독서에 대한 갈증과 의지 따위가 전혀 없을 때조차 손을 뻗어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까맣게 잊을 만해질 때마다 어딘가에서 마주쳤고 나는 편한 마음으로 펼쳐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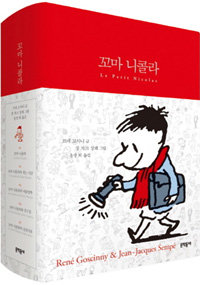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도 상페를 좋아했던 것 같다. 미술 수업 시간에 상페의 데생을 모방한 기억이 난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스케치북에다 코를 박고 상페의 그림을 따라 그렸다. 어쩌면 그림을 따라 그렸다기보다는 여백을 잘 남겨두는 것을 따라 했다.
한 교실의 모든 캐릭터의 크기를 축소하고, 칠판이나 창문 같은 것은 더 크게 그려 넣어야 상페스러운 데생이 완성됐다. 상페의 세계에 클로즈업은 없었다. 세밀한 묘사 또한 없었다. 상세함을 표백한 듯한 한 페이지에서 절묘한 원근감이 다가왔다. 모든 것을 멀찌감치 관망하는 기분. 그 거리감이 더더욱 이 이야기에 부담 없는 실소를 보태게 했다.
아슬아슬한 소동과 조마조마한 말썽이 모든 에피소드에 등장하지만, 이야기에 몰입된 채로 심장을 졸이며 아슬아슬해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 시대의 청소년들에겐 어른과 아이의 갈등 앞에서 미리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관망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텍스트였을지도 모르겠다.
주인공 니콜라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 주변 인물들은 먹보, 싸움꾼, 낙제생, 부자, 잘난 척하는 아이였는데 한부모가족, 왕따, 가난한 아이, 장애인, 전학 온 아이 등은 등장하지 않았다. 여자아이도 주요 주변인물로 등장하지 않았다. 한 시대가 열광했던 이 어린이책에 무엇이 표백됐는지를 이번 기회에 처음 헤아려보게 됐다.
김소연 시인
그때 그 베스트셀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인터뷰
구독
-

김대균의 건축의 미래
구독
-

동아경제 人터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조기유학 붐 몰고온 남다른 열정 스토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11/02/9818253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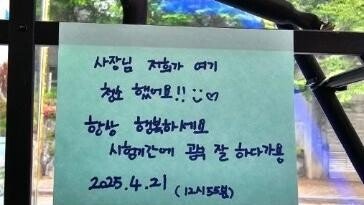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