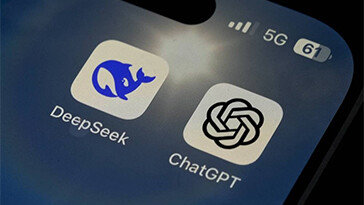용은 상상의 동물로 봉황 기린 거북과 함께 상서로운 사령(四靈)의 하나로 꼽힌다. ‘본초강목’에 의하면 용의 모습은 ‘머리는 낙타같고 뿔은 사슴같고 눈은 토끼같고 귀는 소와 같으며 목은 뱀과 같고 배는 큰 조개와 같고 비늘은 잉어와 같고 발톱은 매와 같으며 발바닥은 범과 같다’고 한다. 이처럼 용은 날짐승 들짐승 물짐승의 복합적인 형태와 능력을 갖추었기에 뭇동물의 우두머리로 꼽힌다.
▼문헌-설화 자주 등장▼
용의 순수한 우리말은 ‘미르’. 미르는 물의 옛말인 ‘믈’과 상통하는 말인 동시에 ‘미리(豫)’의 옛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용이 등장하는 문헌 설화 민속에서 보면 용의 등장은 반드시 어떠한 미래를 예시해주고 있다. 용이 출현한 후에는 성인의 탄생, 군주의 승하, 농사의 풍흉 등 거국적인 대사의 기록들이 따르는 것이다.
용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면서 수많은 민간신앙 민속 설화 미술품 등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신앙에서의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水神)이자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으로 믿어져 왔다. 신라시대부터 가뭄이 들었을 때 용의 화상을 그려놓고 비를 빌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며 어촌에서는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새해가 되면 궁궐의 문이나 민가의 문에 용 그림을 붙이는 풍속이 있었다. 용의 신령스러운 힘을 빌려 악귀를 쫓으려는 의도에서다.
▼악귀 퇴치하는 수호신▼
우리 역사의 많은 설화에서 용은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해 왔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는 용과 관련된 설화가 86편 실려있다.
설화에서 용은 주로 시조의 어버이 또는 나라를 지키는 신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백제 무왕은 지룡(池龍)의 아들이며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배필이 된 알영은 용의 왼편 갈비에서 나왔다고도 전해진다. 삼국통일을 완수한 신라 문무왕은 죽어서 호국대룡(護國大龍)이 되어 지금까지도 동해를 지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용그림으로 제일 오래된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 가운데의 청룡이다. 조선시대 작품으로는 종이나 비단에 그려진 용 그림들이 남아있다. 또 석탑 부도 등의 돌조각이나 와당 연적 병 항아리 그릇 등에도 용모양을 형상화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원숭이띠와 잘맞아▼
예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는 용으로 상징됐다. 용은 권력을 상징하므로 용꿈은 태몽 중의 으뜸으로 꼽힌다. 장차 크게 이름을 떨칠 아들을 낳게 될 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은 돼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돼지띠 어머니가 용꿈을 꾸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귀하게 되기는 커녕 말썽만 일으킨다고 전해진다.
우리 조상들의 띠풀이에 따르면 용띠생들은 건강하고 정력적이며 정직하고 용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신뢰감이 두터운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반면 화를 잘 내고 흥분을 잘 하며 고집이 세고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는 얘기가 있다.
모든 띠들 중에서 용띠는 애교만점인 원숭이띠에 가장 끌리며 원숭이띠는 용띠의 장엄함에 끌려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또 용띠는 강하고 쥐띠는 기술이 좋기에 힘을 합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결혼궁합에서 용띠와 돼지띠는 서로 꺼린다. 용은 자신의 코가 돼지의 코를 닮아 못생겼다고 생각해 돼지를 미워한다는 것.
(도움말〓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허영환 성신여대 박물관장)
〈윤경은기자〉keyo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