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약을 고를 것인가, 환자나 약사가 약을 고를 것인가.’
정부와 의료계가 약의 선택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이 약품명을 지정하는 약품명 처방제와 성분명 처방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의료 소비자에겐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3일 두통·소화불량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 강북 지역 A보건소에서 성분명 처방전을, B의원에서 약품명 처방전을 받았다.
A보건소의 성분명 처방전은 ‘아세트아미노펜 500mg, 메페나믹 애시드 250mg(이상 두통약 성분) 시메티딘 200mg(위장약 성분)’, B의원 약품명 처방전은 ‘부광 싸이메트정 200mg(위장약), 부광 타세놀 이알서방 1정(두통약)’이라고 쓰여 있었다.
두 처방전을 들고 B의원 근처 약국으로 갔다. 이곳에서 약을 짓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인근 다른 약국에선 약품명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 수 없었다. 이 약국의 약사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다양한 약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제는 주머니가 가벼운 환자에게 제격이다. 성분이 같더라도 약값은 천차만별이다. 성분명 처방전으로 3일치 약을 지어 보니 약값(조제비 제외)이 가장 싼 약을 고르면 306원, 가장 비싼 약을 고르면 1323원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성분명 처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혈압 환자 전모(60·여) 씨는 성분명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지만 약사에게서 “약 종류만 50개가 넘는데 약의 종류를 정하기가 난처하다”는 말을 들었다. 전 씨의 담당의사는 “만성질환은 특정한 약을 지정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은 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약마다 효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품명 처방제가 적절하다는 게 의사, 약사, 환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이 같더라도 치료 효과가 다르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사의 처방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약품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약사들은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 제도를 환영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은 다르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日 교과서 왜곡 :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 :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절차 >
-

동아리
구독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법조 Zoom In :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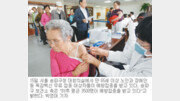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