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노조가 파업하던 2007년 7월 간세포암 수술을 받으러 경남 마산시에서 상경한 김모 씨(62)는 원무과 직원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접수대를 꽉 붙잡아야 했다. 하루를 1년같이 무려 한 달을 기다려 온 수술이었다. 하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다시 수술 날짜를 잡았다. 암 수술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 수술은 8월 22일에 잡혔다. 원래 수술을 계획했던 날짜보다 40여 일이나 늦어졌다. 그사이 간 상태는 더 나빠져 세브란스병원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위를 절제해야 했다.
수술 미루고 간호 안되고…
노조 파업은 예정돼 있었다. 김 씨는 그런데도 병원에서 수술 계획을 잡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병원의 파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세브란스병원과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브란스병원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있다. 라디오 건강프로그램 작가인 김은경 씨(36·서울 용산구)는 어머니(당시 58세)를 잃었다. 어머니는 난소와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고 22일 후인 7월 14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김 씨는 “수술 직후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았는데 파업이 시작되면서 간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 폐색이 왔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병원도 파업을 한다. 병원 파업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파업”이라는 비난을 받지만 병원 노조도 파업할 권리는 있다. 병원 경영자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닫거나 폐업할 권리가 있다. 세브란스병원 노조는 2007년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파업했다.
노조의 기본권인 파업권은 환자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충돌한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생명권, 건강권, 진료권에 관한 법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권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법이라고 판단했다.
병원 파업권 對 환자 생명권
법원은 간세포암 수술을 받은 김 씨 사건을 심리한 뒤 화해 권고결정을 내리면서 병원 측이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에게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환자의 생명권이 침해될 정도로 파업을 이어갔다는 점을 과실로 들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 파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어머니를 잃은 김 씨의 사건은 1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의사와 알고 지내던 김 씨는 “소송 이후 의사들의 ‘두 얼굴’을 봤다”고 토로한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태도가 달라졌다. 보상이야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결정되겠지만 지금이라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밝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각계 표정-주한미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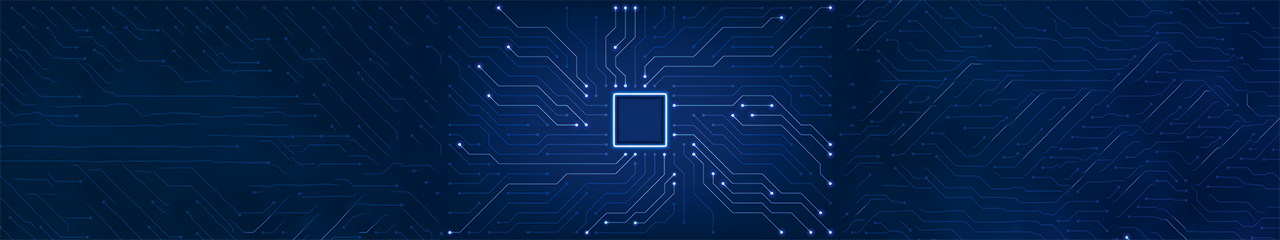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사설
구독
-

정일천의 정보전과 스파이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