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헬스클럽에 안 가고, 소파에 드러누워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해외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과 앉아서 TV를 보며 먹는 것을 더 즐기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의지 차이가 아니다. 우리 뇌 안에 성취욕과 보상심리를 자극하는 유전자의 차이가 크다.
스웨덴 연구팀은 2006년 한 해 동안 일란성 쌍둥이 5334명과 이란성 쌍둥이 8028명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지켜봤다. 그 결과 일란성 쌍둥이들은 이란성에 비해 여가생활이 대부분 비슷했다. 연구진은 “유전자가 완벽히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들의 성향이 같다는 것은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이 주목하는 것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었다. 실험쥐 곁에 쳇바퀴를 두면 다른 실험쥐가 자고 있는 밤 시간에도 계속 바퀴를 돌리며 뛰는 쥐들이 있다.
연구진은 실험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카인 성분이나 ‘리탈린’을 뇌에 투입했다. 리탈린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아이들에게 투여하는 약물로 집중력을 높여준다. 보통 쥐들이 쳇바퀴를 구르고 있을 때 마약성분인 코카인을 주입하면 쥐들은 더 열심히 달렸다. 반면 원래부터 뛰는 것을 좋아하는 쥐들은 약물 투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많이 뛰는 쥐들은 일반 쥐들과 달리 약물이 주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뛰는 행동 자체에서 이미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유전자는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 버튼’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워싱턴대 글렌 덩컨 운동사회학과 교수는 “학교 내 쌍둥이들의 유전자와 운동 시간을 비교해보면 유전자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더 우세했다”고 말했다. 즉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성향을 보였던 실험 대상자들도 눈앞에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힘들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택한다는 것이다. 덩컨 교수는 “몸을 자주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日 교과서 왜곡 :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 :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절차 >
-

법조 Zoom In :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구독
-

오! 여기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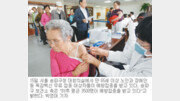

![“1초 스캔으로 잔반 줄이고 건강 지키는 마법”[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6662.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