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쌀쌀해지면 눈이 감기지 않고 입이 비뚤어진 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환자들은 안면 말초신경이 마비된 경우인데 ‘구안와사’라고도 한다. TV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구안와사에 걸린 선조 후궁 공빈의 동생 김병조의 치료를 놓고 어의 양예수와 경합하는 장면이 나왔다. 허준은 구안와사의 원인을 반위(反胃·위암의 일종)로 진단하고 극적으로 치료했다. 구안와사라 해도 근원이 되는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구안와사와 뇌중풍(뇌졸중)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뇌중풍으로도 안면의 말초신경 마비가 올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자가 눈을 감거나 이마에 주름을 잡는 데 문제가 없다. 실제 임상에서도 구안와사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대개 고령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 어떤 때는 구안와사에 반신마비와 같은 증상이 동반한다.
한의학에서 얼굴은 위, 대장과 같은 소화기 관련 경락과 연계된다고 본다. 따라서 반위와 같은 문제가 얼굴에서 구안와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당연히 반위를 치료해야 한다.
구안와사 치료에서는 먼저 장-얼굴 연계 기혈이 풍부한 경맥인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과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주요 경혈인 합곡(合谷), 족삼리(足三里) 등에 침을 놓는다. 기혈을 소통시켜 병의 원인인 바람을 몰아내는 과정이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안면 말초신경 마비 환자와 가족들은 뇌중풍을 의심한다. 하지만 구안와사는 뇌의 문제는 아니고 얼굴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굴이 감기든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얼굴신경손상의 정도에 따라 예후가 다른 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꾸준한 침 치료로 기혈을 통하게 하면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귀비탕(歸脾湯), 이기거풍산(理氣祛風散) 등으로 기혈을 조리해야 병을 이기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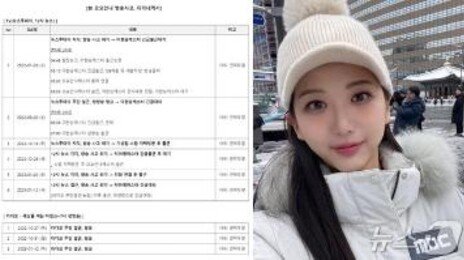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