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뇌사자 신장 이식했다가 살인죄 기소될 뻔”
《한덕종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62)은 국내 장기 이식 역사의 산증인이다. 1983년부터 수술 건수가 신장 이식 2800여 건, 췌장 이식 150여 건이다. 여기에 췌장암 1000여 건을 합하면 모두 4000건에 가깝다. 요즘도 사흘에 한 번은 수술을 집도한다. 경험이 쌓인 만큼 성공률도 높다. 1999∼2010년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은 환자 가운데 1형 당뇨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5.1%, 2형 당뇨병 환자는 100%다.》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생성이 안 되는 경우,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성은 되지만 분비가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당뇨병을 완치하는 방법은 췌장 이식밖에 없다.
4000건의 수술 가운데 한 교수가 꼽은 생애 최고의 수술은 무엇일까. 그는 가장 성공적인 수술이 아니라 가장 도전적인 수술을 꼽았다.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한 1990년의 수술. 이로 인해 그는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며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 교수는 그해 1월 25일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환자의 신장을 김모 씨(55)에게 이식했다. 김 씨는 8년간 신부전증을 앓던 환자였다. 신장 이식을 받기 전까지 이틀에 한 번은 5시간을 누운 채로 인공 투석을 해야 했다. 물 한 모금, 김치 한 젓가락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
10시간에 이르는 수술이 끝난 뒤 김 씨는 “다시 태어났다”며 한 교수에게 감사했다. 김 씨에게 투석을 받지 않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지금은 전담 코디네이터가 있지만 당시는 의사가 직접 장기 기증자와 이식자를 찾아야 했다. 뇌사자가 생기면 신장내과 의사한테 환자 명단을 받아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데 수술을 하겠느냐”고 직접 전화를 돌렸다.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하는 첫 수술은 1989년에 했다. 경과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신부전증 당뇨병 환자 병동에서 이식받으려는 환자가 줄을 서기 시작했다. 김 씨도 그중 1명이었다. 환자가 새 삶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신문에 관련 기사가 실리면서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기 시작했다.
“검사도, 기자도 뇌사가 뭔지 인식조차 없던 시절이었어요. 뇌사는 식물인간 상태와 다릅니다. 뇌사는 뇌 전체가 손상돼 곧 신체 기능이 멈춥니다. 식물인간은 손상 부위가 대뇌의 일부이므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뇌사만 죽음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뇌사하면 보통 2주 안에 심장이 멎는다. 하지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법이 없으니 실정법 위반이었다. 신장을 이식받은 김 씨는 분개하며 보건사회부 검찰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한 교수의 구명운동을 펼쳤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8년에 뇌사자 신장 이식이 이뤄진 뒤 사회적 논란 끝에 법이 마련됐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곤혹스럽더라고요.”
다행히 3개월이 지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뇌사자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했다. 1999년이 되어서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장기 이식을 하다 보면 애틋한 사연을 자주 만난다. 그중 하나는 5년 전 예비 신랑 백모 씨(46)로부터 신장 하나와 췌장의 40%를 이식받은 예비 신부 박모 씨(32). 뇌사자가 아닌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 신장과 췌장을 당뇨 합병증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 자체가 처음인 데다 예비 신랑의 순애보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한 교수는 “아픈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장기 기증까지 한다고 하니 성공해야 한다는 부감감이 컸다”고 말했다.
둘은 나란히 누워 수술실로 향했다. 막상 개복을 하고 나니 예상보다 어려웠다. 박 씨의 정맥이 피떡으로 모두 막혀 있었기 때문. 신장과 췌장을 이식해도 제 기능을 할지 확신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췌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문제는 신장이었다. 결국 이식 수술 후 동료 교수가 피를 돌게 하는 2차 수술을 했다. 신장이 숨을 쉬기 시작하자 소변이 쏟아졌다. 박 씨 부부는 그해 여름 결혼했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산다.
힘들다는 외과의사 중에서도 장기 이식은 더 고달픈 분야다. 늘 대기해야 하고 사후 관리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 한 교수는 이런 분야를 택한 이유에 대해 “기적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자가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이르면 바로 다음 날 인슐린을 끊습니다. 평생 약을 먹거나 투석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 한 번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환자나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의사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내생애 최고의 수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사람, 세계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내 생애 최고의 수술]식도수술 1500여회…심영목 교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06/27/38231528.10.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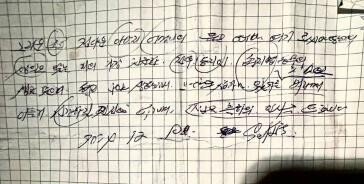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