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이란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갓 서른이 된 어린 저에게 아버지는 인생이란 항로의 등대였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저는 등대의 불빛을 잃었습니다. 나침반이라도 갖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작가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책을 남겼죠.
그때부터 간혹 아버지의 서재에 가 앉곤 했습니다. 아, 이곳이 그때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늘어놓으셨던 곳이구나. 아, 이 사진이 바로 그때 말씀하셨던 장면이구나. 대화를 하듯 아버지의 기록을 되씹었습니다. 솔직히 재미는 없었습니다. 일기장이 아니라 아버지 일의 기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는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진을 찍고 글을 쓴 건 원고를 팔아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사라져버릴 순간들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을 쓰고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언젠가 갑자기 죽을 수 있지만 뒤에 남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록한 이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이제 시시한 농담과 진지한 의견이 뒤섞인 일기장을 곳곳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라’는 말을 보여주듯 제 친구들의 삶까지 함께.
이런 서비스가 꼭 페이스북일 필요가 있을까요? 싸이월드 미니홈피, 카카오스토리 등등 우리의 일상을 받아서 기록해주는 서비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친구들과 함께 나눈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세상에 무차별 노출되는 건 악몽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과 걱정 때문에 어찌 보면 인류가 처음으로 갖게 된 놀라운 도구인 소셜네트워크에서 멀어지는 것도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무슨 얘기가 적혀 있을까 궁금했던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할아버지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보관 장소는 다르지만 제 삶도 소셜네트워크에 잘 보존될 겁니다. 유언장이라도 쓰게 되면 가장 먼저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적어야겠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That's IT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구독
-

실버 시프트, 영올드가 온다
구독
-

이준만의 세상을 바꾼 기업가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상훈 기자의 That's IT]조삼모사 통신서비스, 소비자가 원숭이인가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09/25/4965157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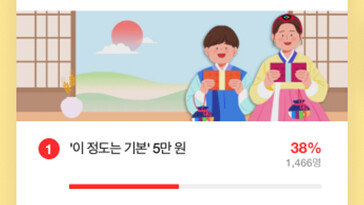

![[사설]트럼프도 “北은 核국가”… 워싱턴에 韓 목소리가 안 들린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90915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