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김희정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

김희정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45) 인터뷰는 환자 수술을 끝낸 직후 시작됐다. 지칠 법도 한데 활기가 넘쳤다.
원래 체력이 좋은지 물었다. 예전에는 수술 후 몸 여기저기가 쑤셨다고 한다. 김 교수는 젊은 유방암 환자들을 많이 수술하는 편이다. 흉터를 최소화하려다 보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특히 어깨와 손목이 많이 아팠다.
지금은 안 아프단다. 달리기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까무잡잡한 피부가 유독 눈에 띄었다. 피부를 하얗게 보이려고 미백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김 교수도 원래는 피부가 하얀 편이었다고 했다. 매일 달리다보니 까맣게 변했다는 건데, 조금도 개의치 않는 표정이다. 오히려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며 웃었다.
○ 5년 전 해외유학 때 달리기 입문
과거에도 여러 운동을 시도했다. 특히 요가를 재미있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체육관까지 왕복 시간을 포함해 2시간씩 걸리는 운동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았다. 늘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병원 내 헬스시설을 잠깐씩 이용하는 게 전부였다. 2017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 암센터로 유학을 갔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다. 현지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되자 집과 학교 사이, 약 5km를 달리기 시작했다. 40∼50분에 주파했으니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었다. 노트북이 든 가방을 메고 천천히 달렸다.
얼마 후 이사했는데, 병원으로부터 11km 떨어진 곳이었다.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났지만 그래도 달렸다. 나중에는 자전거를 하나 사 달리기와 병행했다.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가면 돌아올 땐 달렸다. 다음 날에는 달려서 병원에 갔고, 돌아올 때 자전거를 탔다.
2018년 여름이었다. 현지에서 철인3종 경기가 열렸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수영을 오래 했고, 보스턴에 온 후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를 매일 했으니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참가신청을 했다.
수영으로 750m, 자전거로 20km를 간 뒤 마지막으로 5km를 달렸다. 정확한 기록은 기억나지 않는다. 김 교수에게 그런 기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완주했다는 것과 가족들이 함께 응원해줬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귀국 후 달리기로 출퇴근

시간을 계산해 봤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면 30분이 걸렸다. 한강공원에서 달린다면 1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았다. 2019년 3월, 김 교수는 ‘출퇴근 달리기’에 도전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약 10km. 천둥 번개가 내리치거나 미세먼지가 극도로 심한 날을 빼고는 거르지 않고 달렸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도 뛰었다.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시간∼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병원에 도착하면 계단을 이용해 연구실이 있는 12층을 올랐다.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 후 한 달은 힘들었다. 단지 한두 달을 안 달렸을 뿐인데, 그 사이에 몸이 녹슬었나 보다. 근육통이 점심시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로는 예전의 컨디션을 회복했다. 오랜 시간 수술해도 몸이 아프지 않게 된 게 이때부터였다. 김 교수는 “어느 정도 달리면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새소리도 들린다.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달리고 나면 하루가 상쾌해진다. 육체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좋아지는 기분이다.
○트레일 러닝과 암벽 등반에도 도전
지난해 시어머니를 따라 북한산에 간 적이 있다.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지만 히말라야도 세 번 갈 정도로 ‘산 마니아’다. 김 교수는 전에 산에 간 적이 별로 없다. 한 수 배우는 셈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인상이 깊었다고 한다. 울창한 숲속에 있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후 초등학생 막내딸을 데리고 산에 종종 갔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등산로를 따라 달려봤다. 이른바 ‘트레일러닝’을 시작한 것이다. 경기 지역의 청계산에서 광교산까지 27km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다. 오전 9시에 시작한 달리기는 오후 4시에야 끝났다. 신세계를 체험한 것 같았다. 트레일러닝에 빠져들었다.
이때부터 김 교수는 매주 주말 휴일 중 하루는 산에 오른다. 물론 트레일러닝을 하기 위해서다. 보통은 10∼15km의 거리를 달린다. 김 교수는 “주말에 1시간 여유가 생기면 집 근처를 달리고, 3시간 여유가 있으면 산에 가서 뛴다”고 말했다.
트레일러닝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욕심이 생겼다. 암벽 등반이었다. 뭐가 하고 싶으면 꼭 해야 하는 성미다. 김 교수는 트레일러닝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등산학교를 찾았다. 아직 초보 딱지를 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차례 암벽 등반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에게는 꿈이 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들과 함께 달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환자 중 일부는 호르몬 치료로 인해 젊은 데도 갱년기 증세가 나타난다. 그런 환자들에게는 식단 조절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꼭 필요하다. 김 교수는 “말로만 운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달리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달리기로 건강 다지려면 천천히 오래 달려야 효과… 보통사람은 10km 적당 |
| 달리기의 매력은 뭘까. 김희정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는 “해외 학회에 참가할 때도 운동화를 꼭 챙겼다”고 했다. 아무 장비 없이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달릴 수 있고, 주변의 러너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달리기의 큰 매력이다. 김 교수는 올해 4, 5월에 각각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달렸다. 풀코스 마라톤은 첫 도전이었다. 사실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완주하는 데 성공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스스로 기록을 측정했다. 5시간 반 정도였다. 기록 자체만 보면 하위권이다. 김 교수는 기록에 별 미련을 두지 않는다. 달리고 싶어 달리는데 기록이 왜 중요하냐는 것이다.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기록에 신경 쓰지 말 것을 권한다. 기록을 염두에 두면 무리하게 빨리 달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천천히 오래 달리기를 김 교수는 선호한다. 그래야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는 건지, 빨리 걷는 건지 애매한 속도도 괜찮다. 이렇게 달리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고, 그때 가서 속도를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달릴 때 가장 좋을까. 김 교수는 개인적 차이가 있다는 전제 아래 10km를 추천했다. 처음에 2, 3km 구간에는 숨이 차고 옆구리가 아플 때도 있다. 이때 멈추지 않고 숨을 깊게 쉬면서 천천히 계속 달리면 3, 4km 구간부터 서서히 좋아진다. 대체로 5km 구간을 넘어서면 몸이 편안해진다. 이때부터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주변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단다. 김 교수는 “후반부 5km 구간은 행복한 달리기”라고 말했다. |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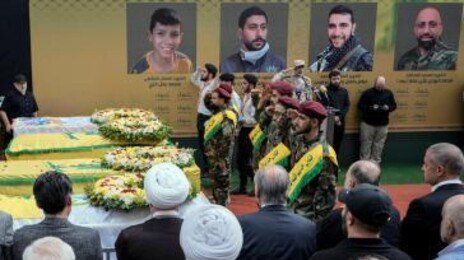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