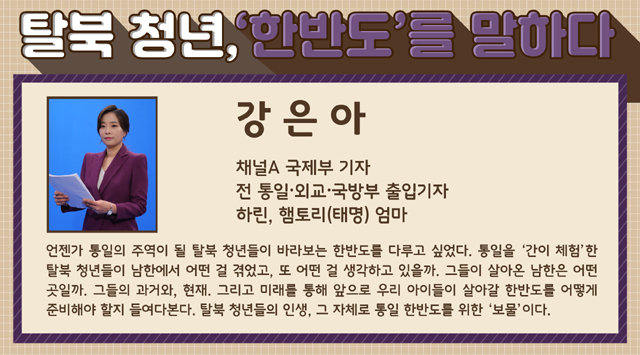
《언젠가 통일의 주역이 될 탈북 청년들이 바라보는 한반도를 다루고 싶었다. 통일을 ‘간이 체험’한 탈북 청년들이 남한에서 어떤 걸 겪었고, 또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이 살아온 남한은 어떤 곳일까.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한반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들여다본다. 탈북 청년들의 인생, 그 자체로 통일 한반도를 위한 ‘보물’이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나이는 9살. 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넌 후 중국, 몽골을 거쳐 남한에 도착했다. 부모님이 어린 형제를 데리고 북한을 떠난 이유는 하나, ‘신분의 한계’ 때문이었다.
“아버지께서 평양대 기계종합대학을 졸업했어요. 평양의 직장으로 보장받는 학력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북한 일본강점기에 동경대를 나오셨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남포로 떠나셔야 했어요. 몇몇 친척이 중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됐죠.”
그 후로도 김여명 씨 가족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학교에 가서도, 김 씨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업을 듣지 못했다.
한국은 기회의 땅?
한국에 와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됐을 때, 그래서 더 설렜다. 여기선 더 잘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입학하고 처음 만난 선생님들은 김 씨를 불러 ‘탈북민이란 걸 숨기라’고 가르쳤다.
“선생님들이 조심하라고, 북한에서 온 걸 밝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북한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원도에서 전학 왔다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소개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니 제가 강원도 출신이 아니란 건 금방 티가 났죠. 또 부모님들끼리 교류할 상황들이 생기다보니, 자연스럽게 친구 부모님들이 제가 북한 출신이란 걸 알게 되셨고 친구들도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영화를 보고 와서는 저보고 ‘간첩’이라거나, ‘무장공비’라며 놀려댔죠. 주먹다짐도 여러 번 했어요. 다행이 담임선생님께서 중재를 잘 해주셨어요. 친구들에게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시며 이해시키려 노력하셨죠.”
하지만 김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히 친구들에게 자신을 드러냈다. 그 방법으로 선택한 건 북한에서 몸에 익힌 ‘봉사’와 ‘솔선수범’이었다.
남한 친구들은 이상하게 청소를 싫어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청소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닌,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늦게까지 남아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궂은 청소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잘하지 못하는 건 먼저 나서서 도와줬다. 어려서부터 무언가 만들기를 잘 하던 그는 종이접기 시간마다 서툰 친구들을 도와줬고, 그렇게 친한 친구를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반장도 했고, 전교 부회장도 했다. 친구들은 김 씨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처음으로 남한 땅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노력해서 일군 결과물이었다.

처음 본 지구본, 그 충격
“한국에 와서 지구본을 처음 봤어요. 충격적이었죠. 북한에서는 그냥 ‘북한’과 주적인 ‘미국’이 세계의 전부에요. 세계가 이렇게 넓고, 수많은 역사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 본거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나마 평양에서는 조선중앙TV도 보고, 노동신문도 보고 하지만 지방에선 사실 TV도, 신문도, 완전 단절되어 있어요. 특히 어린 나이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언어’의 장벽도 뛰어 넘기 버거웠다. 친구들의 대화 속에는 처음 듣는 생소한 외래어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으로 섞여있었다.
“한 친구가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햄버거, 살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였어요. 근데 처음엔 그게 뭐냐고 물어보질 못했어요. 학생들만 쓰는 용어들도 많잖아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죠.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모르는 걸 티내기도 그런 애매한 상황이 이어졌죠. 그러다보니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친한 친구가 생긴 뒤에는 정말 매일 물어봤어요.”
(다음 회에 계속)
강은아 채널A 국제부 기자 euna@donga.com
강은아 채널A 국제부 기자 euna@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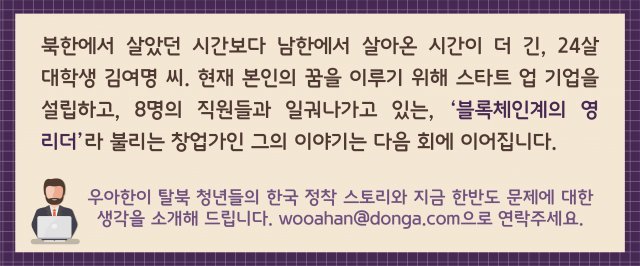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핵실험 날, 학교 창문이 몽땅 깨져…어디든 北서 벗어나고 싶었어요”[강은아 기자의 우아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02/03/93965353.3.jpg)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4349.12.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