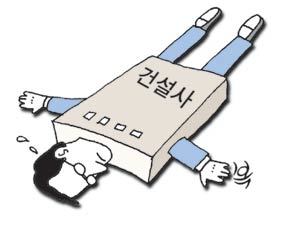
한때는 헬기를 띄워 조망권을 보여 주거나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까지 열며 요란하게 홍보를 했지만 지금은 분양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이렇다 할 행사도 하지 않은 채 덤덤하게 청약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납작 엎드린 이유는 무엇보다 마케팅 행사를 해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청약시장이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규모 단지가 별로 없다는 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꺼리는 요인.
건설사들의 분양현장별 판매비는 전체 사업비의 3∼4%. 단지 규모가 크면 판매비 총액도 늘어나 활발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지만 최근 서울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대부분 100채 안팎이어서 행사를 벌일 만한 여력이 없다.
더욱이 코오롱건설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더 프라우)에서 봤듯 과도한 주목을 끌게 되면 건설교통부가 단속에 나설 뿐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실시돼 차라리 마케팅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계산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마케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질 것”이라며 “요즘은 ‘봄날’이 갔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청계천, 우리곁으로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청계천, 우리 곁으로]D-23, 살아나는 생태계](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