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의 공유택시 서비스인 ‘우버 풀(Uber Pool)’을 선택하긴 했지만 기존 우버보다 요금이 싸다는 생각만 했지 사람이 미리 타고 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했다는 자각이 나중에 들었다.
탑승한 지 1분이나 지났을까. 우버 애플리케이션에는 “약 1분 후에 조너선이 내릴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앞자리가 비었다. 곧 뒷자리까지 비었다. 이제 혼자 좀 편하게 가나 했더니 웬걸, “3분 후 캐서린이 탄다”는 메시지가 떴다. 촌스럽게 불편해하는 나와 달리 캐서린은 가볍게 인사하며 자연스레 탔다.
‘CES 2020’이 열리고 있는 라스베이거스는 이처럼 혁신이 이미 일상이 돼 있었다. 대형 호텔에는 ‘택시 타는 곳’보다 ‘우버 타는 곳’이라는 안내판이 더 많았다. 호텔 앞에는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만큼 우버 차량들이 북적였다.
특히 제2의 우버를 꿈꾸는 리프트 등 새로운 플랫폼의 성장세가 눈에 보였다. 우버 기사가 리프트까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버가 독점하던 시장이 경쟁 체제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편리하고 싸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혁신의 선순환’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버가 ‘우버풀’까지 내놓은 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출장지에서 느낀 혁신의 만족감은 한국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혁신산업에 대한 한숨으로 이어졌다. 여러 규제 때문에 우버 같은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 한국에선 타다 같은 일종의 ‘편법 혁신’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다 한국 시장에서 쌓은 서비스 노하우를 인정받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한국에서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에 지분을 넘기는 대신 DH의 지분을 일부 받기로 한 배달의민족은 독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정치권에 발목 잡힐 판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유근형 산업1부 기자 noel@donga.com
현장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노후, 어디서 살까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약한 고리 방치한 정부 산재관리대책[현장에서/송혜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1/09/9914636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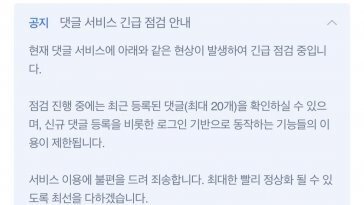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