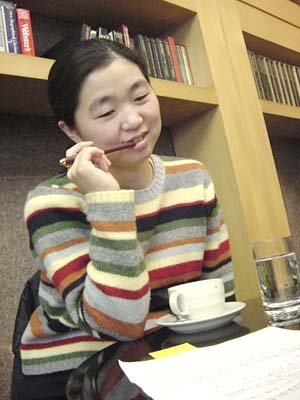
영하의 날씨 속에서 노영심(33)씨는 오렌지색 털모자와 목도리, 털장갑으로 온몸을 꽁꽁 감싼채 도착했다.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흐르는 피아노 곡에 간혹 귀를 기울이기도 하며 자신과 베트남, 그리고 시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온 나라가 통일 분위기에 휘말려 들떠 있을 때 숭실대에서는 '미안해요, 베트남'이라는 공연이 전투경찰의 삼엄한 경비(?)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행사장 주변에는 군복을 입은 월남전 참전 '고엽제 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금방이라도 공연판을 엎어버리기라도 할 기세였고, 베트남 풍경을 담은 액자 서너장이 박살 난 후 사태는 어느정도 진정이 됐다.
가슴 졸이는 긴장 속에서 진행된 '베트남 평화문화제'의 무대 왼편 피아노에는 자그마한 키의 웃는 모습이 그리웠던 노영심씨가 잔잔한 피아노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데,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악수를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저 먼 모퉁이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에요"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기획한 이날 문화제에서 그녀는 영화 '디어헌터' 주제곡 카바티나를 연주해 공연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위안부 할머님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보고 베트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녀는 단순히 공연을 위해 초대된 연예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맨날 일본에다가 종군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사과해라' '보상해라' 하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것에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늘 피해자였던 우리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바라는 곡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베트남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자기 생각을 주저없이 쏟아냈다. 그 수줍음을 타던 '노영심'씨의 모습은 그녀의 유창한 논리 속으로 녹아들었다.
"우리가 미안하다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국제 평화라고 이해해요. 그것을 평화적인 하나의 씨앗이라고 보고 그 씨앗을 우리는 음악으로 표현하죠"
그녀는 베트남 전에서의 희생자는 고엽제와 전쟁의 기억으로 고통받는 참전군인과 베트남 사람들 '양쪽 모두'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운동을 위한 운동에 그쳐서는 안되죠. 반대쪽이나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녀는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베트남전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함께 고엽제 전우회의 입장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영심씨가 시민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99년, 자신의 '결혼설' 파동 때문이었다.
모 언론에서 보도된 결혼발표로 고통을 받던 그녀는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녀는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참여연대의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시작된 시민단체와의 인연으로 그녀는 현재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풀꽃세상을 만드는 모임, 기지촌 어린이 돕기, 가수 이문세씨가 진행하는 근육병환자 돕기,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많아지고 더욱 큰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작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지지를 보내는 그녀는 맺힌 한(?)이 있다는 듯, 자신이 관심있는 시민운동은 '언론'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아직 가슴에 날이 서 있어요. 결혼에 대해 생각하다가도 그때 생각만 나면 진저리가 나요"

인터뷰를 마칠 무렵, 그녀를 알아본 종업원이 사인을 부탁하자 가볍게 웃으며 "많은 복 받기를…"이라고 예쁜 글씨를 꼭꼭 눌러 적는다.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가 노영심씨는 매년 5월 17일 공연을 갖는다. 벌써 8년째다.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인데 뭔가 기념할 방법을 찾다가 늘 공연을 해야지하고 생각했어요"
10주년에는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 것이 꿈이라는 그녀는 "역사가 항상 미래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 광주의 5월도 아름다운 공연을 볼 수 있는 날로 바뀌기를 바래요"라며 웃어보인다.
올 한해 세상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그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어떡하죠? 너무 절망적인가요?"라며 인터뷰를 끝마쳤다.
카페를 나서며 작별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던 그녀는 반짝반짝 빛나는 빙판 길을 쪼르르 달려왔다.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세상이 풍경같았으면 좋겠어요, 바라볼 수 있는 풍경 같은 세상말이에요"
이제는 '피아노'와 '선물하기'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녀가 오늘은 참 좋은 '선물' 같았다.
최건일/동아닷컴 기자 gaegoo99@donga.com
한선교의 농구에세이 >
-

횡설수설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선교의 농구에세이]“수비없인 공격도 없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11/11/687704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