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쌍꺼풀 진 눈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이 ‘1980년대 버전’은 분명 생뚱 같다. 쌍꺼풀과 ‘그때 당신은…’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러나 부조화(不調和)의 의식이라고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의 쌍꺼풀은 가시적(可視的) 변화다. 사람들은 한결 부드러워진 대통령의 눈매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달라진 리더십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채우려 한다. 상생(相生), 포용, 통합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상상력만으로 신뢰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사람들 열 명 중에 일고여덟은 사흘 뒤 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2년이 된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한마디로 ‘아직 2년밖에 안 됐느냐?’는 것이다. 이런 반응에는 물론 ‘반노(反盧) 정서’의 비아냥거림이 포함돼 있겠지만 그 수가 열 중 일고여덟이라면 단순히 일부의 악의(惡意)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런 반응이 정 의심스럽다면 하룻밤 선술집 잠행(潛行)으로 족할 터이다.
▼전술적 변화인가, 자신감인가▼
하기야 청와대의 대통령이라고 이런 민심을 모를 리야 있겠는가. 최근 보이는 대통령의 변화의 근본 요인 또한 현실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즉, 한 2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되는구나, 계속 이슈를 내놓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경제가 살지 않고서는 헛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실용주의적 ‘뉴 노무현’으로 옷을 갈아입게 했으리란 ‘전술적 변화’의 관점이다.
한 여권 관계자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 위기의식에 따른 피동적(被動的) 변화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자신감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본다. 탄핵 사태와 총선 승리로 한국 사회의 주류 교체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제는 매사에 각(角)을 세우지는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 같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것이어서 반대의 상징성 정도면 됐고, 과거사 청산은 법 제정 여부를 떠나 국가정보원 등의 실제 조사로 이미 효과를 보고 있으니 직접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정의 웬만한 일은 ‘실세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선진화와 동반 성장’이라는 큰 그림에 매달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관점의 차이야 어떻든 그 결과가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변화라면 굳이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 전술적이냐 실질적이냐를 놓고 따질 일은 아니다. 정작 따져봐야 할 것은 이 글 앞머리에 언급한 ‘의식의 부조화’ 문제이며 이는 곧 ‘그때 당신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조기숙(趙己淑)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조 씨는 대표적 ‘친노(親盧) 학자’로 자신의 소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적의(敵意)를 감추지 않는 ‘전사(戰士)’였다. 그는 교수로서의 사적(私的) 견해와 공인(公人)으로서의 역할은 다를 것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보인 극단적 성향에 비춰 균형과 통합이 요구되는 실용주의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한편으로 실용주의를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내 편인가 네 편인가?’에 집착하고 있는 셈이다. ‘일제(日帝) 때 당신은(또는 당신의 조상은) 어디에 있었는가?’ ‘독재 시절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당신은 주류인가 비주류인가?’ 등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분열의 이분법 아래서는 실용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다.
▼지난 2년은 너무 길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식의 ‘자학(自虐) 사관’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 대한민국’을 노래할 일도 아니다. 광복 후 60년 역사에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명암(明暗)이 존재한다. 명암을 끌어안고 그것에서 미래의 교훈을 찾으려는 겸허한 자세야말로 실용주의의 바탕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쌍꺼풀이 남은 임기 3년은 길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부적(符籍)이 될 수는 없을까. 지난 2년은 너무 길었다.
전진우 논설위원 실장 youngji@donga.com
오늘과 내일 : 전진우 >
-

담배 이제는 OUT!
구독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전진우 칼럼]‘이헌재를 위한 변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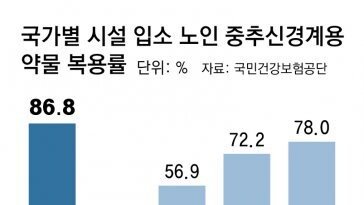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