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탄스러운 것은 석유 파동, 외환위기 같은 거대한 외풍(外風)이 한국 경제에 들이닥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스스로가 성장 엔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탓이다. 경쟁국들의 경제는 순항하는데 한때 항해 속도에서 가장 빨랐던 ‘한국 경제호(號)’는 왜 주춤거리는가.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거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매달린 듯하다. 서울 강남에서의 투기를 두드려 잡는 ‘성전(聖戰)’에서 이기면 된다는 식이다. 물론 부동산 투기가 빚는 해악은 엄청나므로 당연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만 바라보는 좁은 시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을 큰 그림을 볼 수는 없다.
생산의 주역인 기업은 어떤가. 투자 부진 현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기업에는 차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유보자금이 쌓여 있다. 투자할 의욕도, 마땅한 투자처도 없기 때문이다. 투자 부진 요인으로는 정치권발(發) 불안,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대기업 노조의 연례적인 파업, 기업인들의 무기력 등을 꼽을 수 있다.
투자 부진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드니 기업과 개인의 유휴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 투자가 활성화돼야 돈이 기업 쪽으로 쏠리면서 성장 엔진도 신나게 돌아가고 부동산 투기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는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1723∼1790)의 ‘국부론’은 오래된 책이지만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싱싱한 아이디어를 여전히 제공한다. 국부론은 번영의 조건으로 평화, 가벼운 세금, 적절한 사법행정 등을 열거했다. ‘적절한 사법행정’은 재산권의 보호를 의미한다.
미국 투자전문가이자 저술가인 윌리엄 번스타인 박사는 올해 초 출간한 저서 ‘부(富)의 탄생’에서 부국으로 이끄는 4가지 열쇠를 제시했다. 자유로운 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활력 있는 자본시장,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 및 수송 등이 그것이다. 250여 년 전 스미스가 내놓은 전제 조건과 맥을 같이한다.
스미스와 번스타인의 여러 조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장 존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은 ‘민간 존중’이라고 바꿀 수도 있다. 민간의 창의성과 열정이 번영의 원천이라는 뜻 아니겠는가. 공권력은 이런 원천을 존중하고 북돋워야지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예산이 모자라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씀씀이를 늘리면 자원이 낭비되기 십상이다. 정치논리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관치(官治)가 횡행하면 경제를 망친다는 사실은 역사적 교훈으로 익히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후반기를 맞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헌법이 보장한 경제 질서를 훼손했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본다.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부동산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왜 그리 무리한 발언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나.
 |
“경제가 어려워야 빈부 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오히려 재집권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기파괴적 극단주의자가 집권층에 설마 있으랴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의심마저 든다.
원유 값이 오르면 국민총소득을 늘리는 게 더욱 어려워진다. ‘민간 존중’이 경제를 살리고 국민소득을 늘리는 첩경임을 왜 모르나.
고승철 편집국 부국장 cheer@donga.com
오늘과 내일 >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오늘과 내일/이정은]北, 美대표 팔 붙잡던 절박함 남아 있다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25/130501572.1.png)

![이제야 개인 폰 바꾼 대통령 부부[횡설수설/이진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01031.3.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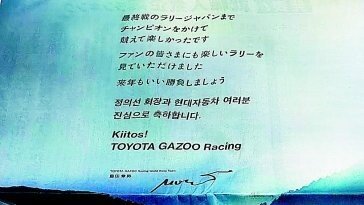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