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세 시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간 페스트는 서구 문화와 예술에 큰 영감을 주었다. 14세기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페스트를 피해 시골 별장으로 들어간 10명의 젊은이들의 이야기이고, 19세기의 음산한 고딕소설들은 페스트의 트라우마가 기저에 깔려 있는 문학 장르이다. 20세기 카뮈의 소설 ‘페스트’는 페스트가 발생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실존적 휴머니즘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페스트는 근대 행정 체계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치학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페스트가 발생한 중세의 도시는 우선 도시 전역이 정확히 바둑판처럼 나뉘어 커다란 몇 개의 구(區)로 분할된다. 구는 다시 동(洞)으로 분할되고, 동은 다시 골목길로 나뉜다. 골목길에는 보초들이, 동에는 감독관이, 구에는 담당관이, 도시 전체에는 행정관이 임명된다. 보초들이 항상 골목의 초입에서 망을 보았고, 감독관들은 매일 모든 집 앞을 지나치며, 각각의 집 앞에서 잠시 머물러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한다. 주민들은 각기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창문을 할당받고, 감독관이 이름을 부르면 그 창문 앞에 서 있어야 했다. 만일 그가 창문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고,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은 아프다는 것이며, 아프다는 것은 위험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다. 이때 당국은 신속하게 개입한다. 이렇게 해서 보초-감독관-담당관-행정관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피라미드적 보고 체계가 형성된다. 이 위계적 피라미드 안에는 그 어떤 침입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미 그것은 단순히 질병 관리가 아닌 거대한 권력 피라미드였다. 이렇게 근대적 행정 체계는 시작되었다.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완벽하게 금지함으로써 권력은 위험한 소통이나 무질서한 뒤섞임을 막을 수 있었고, 아무런 장애물 없이 대상을 완전히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었다. 이 체계야말로 모든 권력이 꿈꾸는 완벽한 통치 상황이었다. 미셸 푸코는 감시에 기초한 근대 규율 권력이 바로 이 페스트 모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행정의 효율성 또는 정책의 공리성(功利性)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그의 패놉티콘 권력 이론은 여전히 매혹적이다. 요즘 메르스 사태 속에서 푸코의 권력론이 혜안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권력은 위로부터의 권력도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권력도 있으므로.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
박정자의 생각돋보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헬스캡슐
구독
-

정도언의 마음의 지도
구독
-

노후, 어디서 살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정자의 생각돋보기]표절이 예술이 되려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06/27/7214193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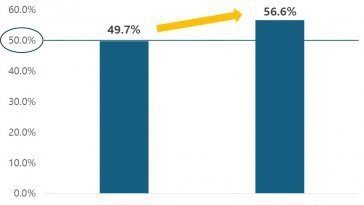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