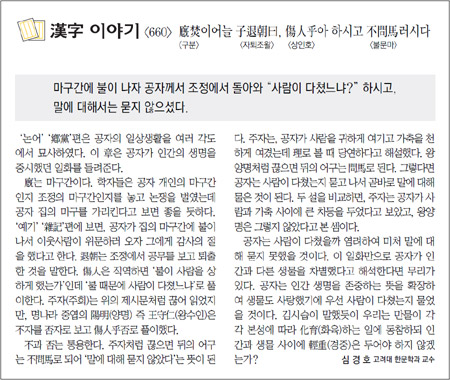廐는 마구간이다. 학자들은 공자 개인의 마구간인지 조정의 마구간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 공자 집의 마구를 가리킨다고 보면 좋을 듯하다. ‘예기’ ‘雜記’편에 보면, 공자가 집의 마구간에 불이 나서 이웃사람이 위문하러 오자 그에게 감사의 절을 했다고 한다. 退朝는 조정에서 공무를 보고 퇴출한 것을 말한다. 傷人은 직역하면 ‘불이 사람을 상하게 했는가’인데 ‘불 때문에 사람이 다쳤느냐’로 풀이한다. 주자(주희)는 위의 제시문처럼 끊어 읽었지만, 명나라 중엽의 陽明(양명) 즉 王守仁(왕수인)은 不자를 否자로 보고 傷人乎否로 풀이했다.
不과 否는 통용한다. 주자처럼 끊으면 뒤의 어구는 不問馬로 되어 ‘말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주자는, 공자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축을 천하게 여겼는데 理로 볼 때 당연하다고 해설했다. 왕양명처럼 끊으면 뒤의 어구는 問馬로 된다. 그렇다면 공자는 사람이 다쳤는지 묻고 나서 곧바로 말에 대해 물은 것이 된다. 두 설을 비교하면, 주자는 공자가 사람과 가축 사이에 큰 차등을 두었다고 보았고, 왕양명은 그렇지 않았다고 본 셈이다.
공자는 사람이 다쳤을까 염려하여 미처 말에 대해 묻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일화만으로 공자가 인간과 다른 생물을 차별했다고 해석한다면 무리가 있다. 공자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뜻을 확장하여 생물도 사랑했기에 우선 사람이 다쳤는지 물었을 것이다. 김시습이 말했듯이 우리는 만물이 각각 본성에 따라 化育(화육)하는 일에 동참하되 인간과 생물 사이에 輕重(경중)은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성매매 신종 업태 >
-

광화문에서
구독
-

이럴땐 이렇게!
구독
-

기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