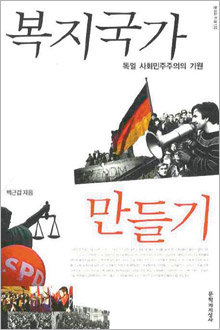
독일 총리였던 오토 비스마르크(1815∼1898)는 1881년 산재보험법 발의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법과 연금보험법을 잇달아 추진했다. 그러나 의회를 거쳐 법이 만들어지자 그는 이 법을 ‘의회와 고위 관료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혹평했다.
독일 사회사를 전공한 박근갑 한림대 사학과 교수(59)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독일의 복지제도 수립 과정을 다룬 책 ‘복지국가 만들기’(문학과지성사)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제도화한 비스마르크가 정작 법 제정 이후 부정적으로 반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을 미끼로 노동자들의 혁명을 누그러뜨리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는 국가사회주의를 추진하려던 것인데 중앙정부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꺼린 의회가 그런 의도를 배제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공동결정과 자치를 앞세운 법을 제정한 것이다.
사회민주당도 사회보험 도입 초기 복지제도에 반대했다. 박 교수는 “노동계급을 충성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지배정치의 술수가 담겨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민당은 1909년에 이르러서야 사회보험을 수호하는 ‘복지정당’임을 선언했다.
처음에는 삐걱거렸던 독일의 복지제도는 각기 다른 주체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골격을 갖춰 나갔다. 박 교수는 “철강회사들이 산재보험의 도입을 먼저 주장했고, 사회보험을 가장 지지한 계층은 중산층이었다”면서 “이런 사실에서 보듯 독일의 복지제도는 어느 한 세력의 주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와 자본, 노동자들이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만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20세기 초에 수립된 독일 복지제도의 골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박 교수는 “독일의 초기 복지제도 도입 과정을 보면 이념적인 대립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탈이념과 협상을 특징으로 하는 독일의 복지제도 역사에서 배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담아 책을 썼다”고 말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성매매 신종 업태 >
-

정용관 칼럼
구독
-

2030세상
구독
-

비즈워치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