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도자기는 질박하고 견고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수준이 몹시 떨어진다. 중국 도자기는 또 일본 도자기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일본 도자기는 종이처럼 얇고 백옥처럼 희며 윤기가 흐르는 듯하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사기장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다. 흔히 ‘도공’이라고 하지만 일본식 표현이다. 사기장이 올바른 용어다. 경국대전에 “사기장의 자손은 다른 부역을 시키지 말고 대대로 가업을 전수하게 한다”라고 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수십 종류의 장인 가운데 법으로 세습을 강제한 경우는 사기장이 유일하다. 어째서일까? 승정원일기에 답이 있다. “그릇을 구워 만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대대로 익혀야 기술이 완성된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사기장은 경기 광주의 분원(分院)에 모여 그릇을 만들었다. 변수(邊首)의 책임하에 조기장(造器匠)이 흙을 그릇 모양으로 만들면 마조장(磨造匠)이 손질하고 건화장(乾火匠)이 건조했다. 이 밖에 흙을 곱게 거르는 수비장(水飛匠), 가마에 불을 때는 화장(火匠), 온도를 관리하는 감화장(監火匠), 그림을 그리는 화청장(畵靑匠)이 있어 분업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많은 장인들이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사기그릇은 늘 부족했다. 부서지는 족족 만들어 보충해야 했기 때문이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놋그릇의 사용연한은 10년, 쇠그릇은 5년, 나무그릇은 3년이다. 사기그릇은 사용연한이 아예 없다. 너무 쉽게 부서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도자기는 온통 흰색인 순백자가 주를 이루었다. 회회청(回回靑)이라는 안료를 써서 푸른 무늬를 넣은 청화백자를 만들기도 했지만, 회회청은 값비싼 수입품이었다. 이 때문에 사치스럽다는 이유로 민간의 청화백자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오면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화려한 도자기가 시장에 풀렸다. 아무 무늬 없는 순백자는 한껏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조선 백자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양해졌지만 이미 중국과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선의 도자기는 화려하지 않다. 혹자는 이를 두고 검소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미학에 입각한 해석이다. 소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과 소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구분해야 한다. 실학자들은 문헌을 조사하다가 고려청자가 ‘비색자기(秘色磁器)’로 일컬어지며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고려청자를 만들던 우수한 기술은 어디로 갔는가? 우수한 장인은 우수한 대우에서 나온다. 장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기술은 발전하지 않는다. 조선의 도자기가 소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조선의 잡史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선넘는 콘텐츠
구독
-

머니 컨설팅
구독
-

유윤종의 클래식感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조선의 잡史]잠녀, 고단한 바다의 노동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6/19/9064487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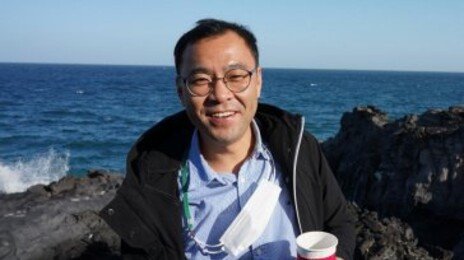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