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혁신기업이 3만달러 한국 이끈다]<6·끝> 성장 막는 한국 현주소

2016년 창업해 서울 강남지역에서 유통플랫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창업 지도사’ 또는 ‘컨설턴트’라는 사람들로부터 일주일에 2, 3통씩 e메일을 받는다. 대부분 국가에서 나오는 벤처 지원금을 받게 해준다며 지원금의 15∼20%를 수수료로 제안하는 내용이다. 인턴을 쓸 때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지원금부터, 정부 과제를 따려면 어떤 식으로 연구소를 등록하면 되는지 제안 내용도 다양하다.
김 대표는 “연구소라고는 하지만 사무실 공간만 등록해두고 이런저런 보조금을 따내는 벤처가 많다”며 “저런 식으로 보조금을 여기저기 나눠줄 바에야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훨씬 유용하게 쓸 텐데 싶은 생각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의 스타트업 육성을 취재한 ‘3만 혁신기업이 3만 달러 한국 이끈다’ 시리즈 마지막 회로 중견 혁신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국내 실태를 조명한다.
○ 혁신 못 알아보는 정부와 금융권

좋은 기술을 알아보고 그에 걸맞은 대출 및 지원을 해야 할 금융권과 벤처투자업계는 기술이 아니라 부동산 등 담보에 기댄 융자만 반복하고 있다. 어쩌다 창업에 성공해도 담보가 없으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기 힘든 여건인 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대체로 15명가량의 기술평가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가위원이 처리해야 하는 기업체 수가 과도하게 많다. 일주일에 걸려서 해야 할 평가를 하루 이틀 만에 처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7월 연례조사차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담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시장 중심의 대출을 확장시킬 방법은 없나”라고 꼬집었다.
‘일단 안 된다’고 하고 보는 정부 규제 방식도 벤처 성장의 걸림돌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고 창업해도 금방 규제에 막혀 성장세가 꺾이기 일쑤라는 불만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차량공유서비스업체 풀러스다. 이 회사는 출퇴근시간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그 외 시간으로 확대하려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일단 용인하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중국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셈이다.
○ 기업가정신, 인재 다양성도 부족
국내에 ‘자수성가형’ 롤모델이 많지 않은 것도 기업가정신이 자라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젊은이들은 알리바바의 마윈(馬雲)이나 샤오미의 레이쥔(雷軍) 같은 기업가들을 바라보며 자라고 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기회는 주로 젊은이들이 빨리 포착하는데 10대 때부터 창업 교육을 받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에 참여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 젊은이들은 경제 활동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인재가 부족한 것도 한국 벤처업계의 단점으로 꼽힌다. 국내(서울) 스타트업의 해외인력 비중은 17% 수준으로 런던(53%), 베를린(49%), 실리콘밸리(45%) 등에 크게 못 미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해외 한인 유학생은 21만 명에 달하지만 국내 취업 대신 전공분야와 무관한 현지 정착 비중이 높아 고학력 인재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해외 유학생을 중국 본토로 불러들이는 ‘U턴 정책’을 펼치며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500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폐쇄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기술력 있는 해외 스타트업에 신속한 비자 발급과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로 무장한 일본 벤처기업들은 해외 유수의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해 기술 창업에 관심이 많은 인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신무경·신동진 기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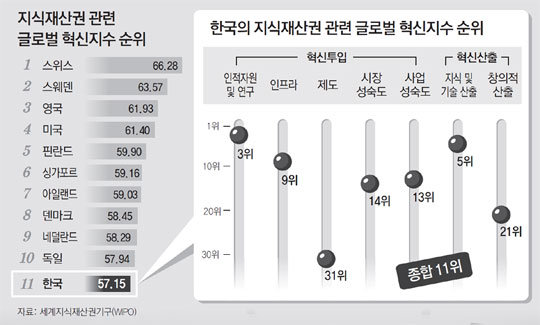









댓글 0